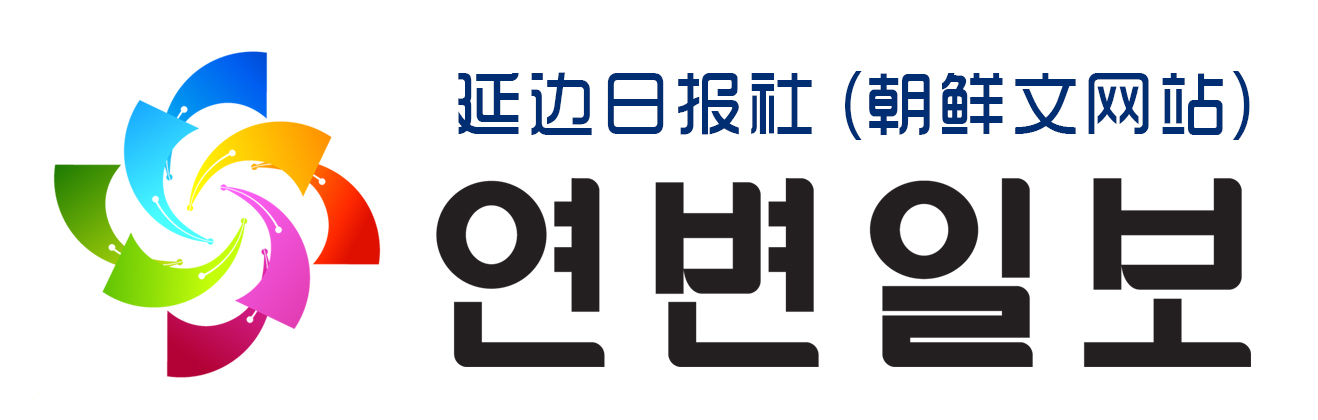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브류쎌 3월 31일발 신화통신 기자 료뢰] 그린란드의 찬바람은 항상 뼈속까지 파고든다. 하지만 올해 그린란드 주민들의 마음이 더욱 얼어들게 한 것은 미국 부대통령 전용기의 굉음이였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섬 구매’를 꾀한 것부터 부대통령 밴스가 청하지 않았는데 제발로 찾아오기까지 미국은 이 빙설로 뒤덮인 땅에 대한 욕심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브류쎌의 일부 관원들은 사적으로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는 마치 ‘강도가 먼저 명함을 건네고 문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이 유머 뒤에는 유럽 대륙이 삼키기 어려운 씁쓸함이 있다. 미국이 ‘관세 몽둥이’와 ‘북극 전략’을 조합한 펀치로 만들 때 유럽은 몇마디 항의에도 분수를 지켜야 했다.
밴스는 대표단을 이끌고 그린란드 북부에 위치한 미국 피투픽 우주 기지에 도착 후 연설을 발표하여 그린란드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북극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마르크가 그린란드의 안전과 방위 등 면에서 “투자가 부족”하고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그린란드는 “단마르크보다 미국의 ‘안전보호우산’하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의 ‘훈계’에 직면하여 단마르크 외무장관 라스무센은 “우리는 이러한 어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는 친밀한 동맹국에게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단마르크 국방부 장관 폴슨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의 “그린란드를 강점”하려는 발언과 행동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강하고 단도직입적 말투로 “명확히 반대한다.”, “이것은 승격 행위이다.”, “선을 그어야 한다.”, “너무 터무니없다.”, “우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련속 사용했다.
이번 ‘강제 방문’ 사건을 돌이켜보면 미국의 행위가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이른바 ‘실력에 기반한 지위’를 이어갔음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섬 구매’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로, 미국은 공격적이고 지정학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일부 매체는 이것이 미국이 유럽에 대해 ‘전략적 자주’을 추진하는 ‘매우 도발적인 압력 테스트’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불청객’적인 도발 책략은 ‘통제력은 쇠퇴했지만 권위욕는 감소되지 않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구도는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다. 브류쎌에서 베를린까지, 런던에서 빠리까지, 유럽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의 자주적 탐구는 이미 대세가 되였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의 고급 정책연구원 토비아스 게르케는 미국 정부의 ‘강압’에 직면하여 “유럽인들도 카드를 갖고 있다.”며 “이제는 카드를 어떻게 내놓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고 대서양 횡단 관계의 균렬이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유럽 지도자들의 여러 면에서 ‘전략적 자주’의 태도와 정책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가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민중들은 미국에 대해 가장 주류적인 위치를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닌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유럽 대외관계위원회의 고급 정책연구원 아르투로 발베리는 이러한 사실이 유럽 민중들이 “워싱톤 외교정책 의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으며 “대서양 횡단 동맹의 잠재적인 종말”을 예고한다고 언급했다.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타국의 령지를 탐내고 동맹 리익을 저버리는… 유럽에게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경제나 외교적 괴롭힘이 아니라 대서양 횡단 관계에 대한 제도적 부패이다. 유럽은 랭전 이후 오래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왔지만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럽 각국은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맏형’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