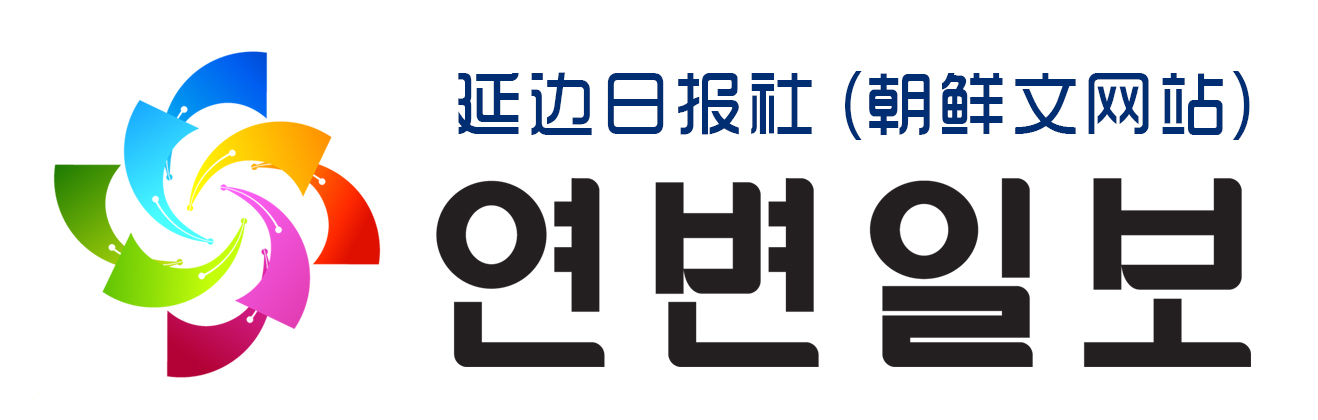해님이 뜨겁게 뜨겁게
땅을 지지며
강물을 들이켜던 그해 여름
백양나무 그늘 밑에서
백구가 기다란 혀를 빼들고
헐떡거렸다
뻐꾹뻐꾹 뻐꾸기가
쉴 새 없이 무더위를 삼켜버리면
풀벌레들 신명 나서 풀숲 누비고
귀가하는 농부들 발걸음 소리에
뭇꽃들 지쳐 잠들던 그날 밤
나와 그 아이, 눈이 백촉이 되여
하나, 둘, 셋…
할아버지 무릎 우에 내리는
별들을 세고 있었다
쑥 태우는 모닥불 옆에서
굶주린 모기떼들 호시탐탐
두만강이 쓴 이야기
문둥이가 산다는
수수밭에서 감부지 따먹던
도깨비 이야기가 아니다
하얗게 꽃피는 감자밭에서
능쟁이 풀 뜯으며
감자열매 따먹던 아린 이야기다
흰 두루마기 입고
긴 팔소매 날리며
동으로 동으로 흐르는 두만강
꼬리섬 모래밭에서 메싹 캐여
달달한 시루떡 만들어 먹던
우리 할매 할배의 버들꽃 이야기
마를 줄 모르는 샘
칠백리 강기슭에 또박또박 써놓았다
흰 두루마기, 기발처럼 여울친다
시래기국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시래기국이다
시래기를 데워서
썩썩 썰어서
된장을 넣고 끓이면 된다고?
아서라
그게 다 모르는 소리
나는 시래기국을 끓이는 법을
60년 동안이나 익혔다
시래기를 데우는 데도 학문이 있다
하물며 시래기를 썰어서 볶고
된장도 알맞게 넣고
양념도 빠뜨리지 말아야 함에랴
거기다가 엄마의 손맛 한스푼
내 정성 두스푼 넣어주면
그래야 제맛인 시래기국
다섯살 때부터 길든 그 입맛
오늘 아침에도
시래기국 그릇엔 딸각딸각
숟가락 부딪치는 소리 분주하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