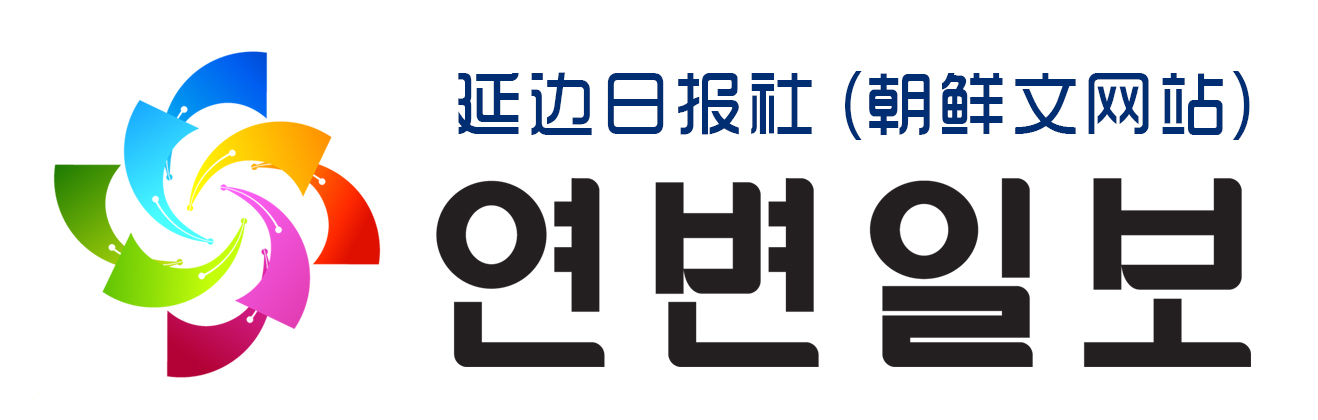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 나니 나는 시시때때로 추억에 잠긴다. 그 추억은 때론 달콤하게 때론 아프게 내 마음의 고요를 깨뜨린다.
외로운 타향살이가 몇해런가, 잠 못 드는 밤이면 나는 추억의 쪽문을 살며시 열고 할머니와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느덧 세월을 거슬러 동심에로 돌아간다.
“할머니이─”
가만히 할머니의 이름을 부른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뜨거운 것이 올리치민다. 할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포근한 내 성장의 행복한 요람이였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태여난 나는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할머니는 불면 날아갈가 쥐면 부서질가 모든 정성과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었다.
나는 밥 먹기 시작해서부터 식성이 유별했다. 나는 매일 닦은 콩가루를 밥에 한데 버무린 콩고물밥만 먹었다. 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는 콩고물이 떨어질세라 귀한 콩을 얻어다 깨끗이 씻어 솥가마에 달달 볶은 다음에는 뒤마을에 있는 야장간집에 가 돌방아에 찧은 다음 보드라운 채로 쳐서 가져오군 하였다. 여섯살 때인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콩고물밥이 없었다. 콩고물이 떨어진 것이였다. 나는 콩고물밥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다. 발버둥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나를 달래주었다. 그래도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않자 할머니는 나를 둘쳐없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집 뒤에 있는 도마도밭에 이르렀다.
할머니는 나를 밭머리에 내려놓고 도마도밭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먹음직한 도마도를 뚝 따서는 치마에 썩썩 닦더니 내 입에 넣어주었다. 도마도는 너무 맛있었다. 그때의 그 달콤하던 도마도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잠자는 버릇도 유별했다.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지 않으면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꺼칠꺼칠한 손바닥으로 내 잔등을 어루쓸어주면 어찌나 시원한지 나는 기분 좋게 달콤한 꿈나라로 려행을 갈 수 있었다. 아, 그때의 할머니의 품은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였던가! 이제는 고인이 된 할머니이지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은 지금도 내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있다.
나의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웠으며 베푸는 것을 무척 즐겼다.
일흔이 넘은 년세에도 할머니는 농사일이든 집안일이든 막히는 것이 없었고 손은 늘 놀 새 없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나의 장갑이랑 양말이랑 떠주었다. 그러다가 한번은 어디선가 깨진 도자기를 얻어다 망치로 동그랗게 예쁘게 다듬은 다음 도자기 중간에 새끼손가락이 나들 수 있을 만큼한 구멍을 뚫고 거기에 한뽐 되는 나무꼬쟁이를 가로 꿰질러 고정시켜 ‘돈물레’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헌솜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한손으로 솜을, 다른 한손으로 물레 밑 나무꼬쟁이를 잡고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 솜이 타래를 치면서 실이 뽑혀 나오는 것이였다. 그렇게 뽑은 실로 할머니는 밤새워 한코한코 정성을 넣어 나에게 양말이나 장갑을 떠주시군 하였다. 그때 철모르는 나는 할머니가 고생스레 뽑아놓은 실을 끊어놓거나 팽이를 치면서 헝클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꾸중 한번 하지 않으셨다. 그해 나는 할머니가 떠준 장갑을 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 날 뒤집 한족할머니가 염소젖을 가져왔다. 먹을 것이 귀하던 그때 세월 할머니는 바삐 끓여서 나를 먹이였다. 그런데 그만 너무 많이 먹었는지 탈이 날 줄이야. 한밤중이 되자 나는 구토하기 시작하였다.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할머니는 나를 둘쳐없고 허둥지둥 의사집에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의사가 없없다. 할머니는 다시 나를 업고 현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나는 구급을 거쳐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제야 마음의 탕개가 풀린 할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비오듯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 철이 들었고 행복한 동년을 보냈다. 베푸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일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간혹 간식을 주면 호주머니에 넣어와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그때면 할머니의 얼굴에는 해바라기 같은 행복한 웃음이 꽃이 되여 피여났다. 그러면 내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지군 했다.
평범한 할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레 일하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늘 베풀면서 살았으며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비오는 날이면 할머니네 집은 여간 흥성거리지 않는다. 잔잔한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네 할머니들은 의례 약속이나 한듯 우리 집에 모여든다. 그러면 집안은 대뜸 활기를 띤다. 이어 할머니들은 뜨끈뜨끈한 아래목에 모여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시집의 흉을 보기도 했고 처녀시절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신혼 때에 있었던 행복한 이야기로 로년의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신나게 화투장을 번지기도 하였다. 이윽고 할머니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삶은 감자를 그득 내온다. 그러면 집안은 대뜸 구수한 감자의 향기로 차넘친다. 삶은 감자를 맛있게 드시는, 볕에 그을린 할머니들의 조글조글한 얼굴에는 즐거운 웃음이 출렁인다.
눈이 내리면 할머니는 제일 첫 사람으로 밖에 나가 큰길의 눈을 쳐낸다. 어느 해인가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 무릎까지 눈이 내려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다. 눈이 멎기 바쁘게 할머니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였다.
“할머니 또 눈 치러 나가? 추운데 나가지 마.”
내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내 새끼 뜨뜻한 아래목에서 삶은 감자 먹으며 놀거라. 할머니가 인차 눈 치고 올게.”
그렇게 꼬박 두시간을 눈치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눈바람에 얼어서 벌겋게 되였고 얼어든 두 손은 얼음장마냥 차거웠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은은히 마음이 아파왔다. 후에야 나는 그 아픔은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평범한 할머니한테서 나는 참된 삶의 자세를 배웠고 사람은 본분을 지키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리치를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선 나는 여느 날과 같이 신 벗기 바쁘게 “할머니─” 하고 웨쳤다. 그런데 집안에는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울면서 할머니를 찾자 어머니는 나를 한품에 꼭 그러안으면서 달래주었다.
“얘야,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다시는 볼 수 없고 너를 안아 줄 수 없단다.”
“나도 할머니따라 하늘나라에 갈래요.”
더는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와 나는 발버둥치며 울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리별의 슬픔을 알게 되였고 할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오래동안 가슴이 아팠다. 평범한 농촌부녀였지만 할머니는 참다운 삶을 살았고 내 성장의 길에서 본보기가 되여주셨다…
아,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할머니,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무척 그리워진다. 50여년 세월이 지났지만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내 그리움의 항만으로 내 마음에 고이 남아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