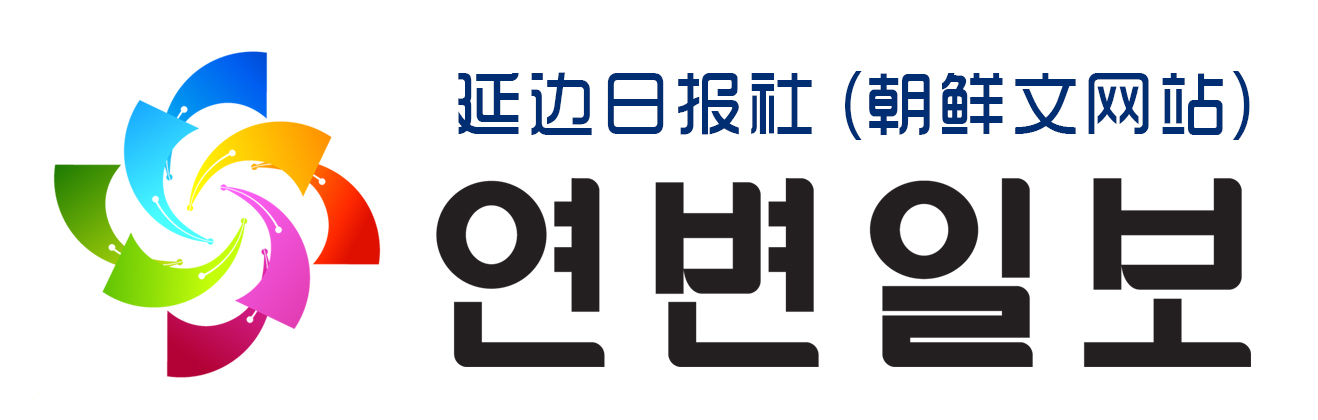미국의 소설가 켄 키지의 장편소설 《뻐꾸기둥지 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머피가 ‘콤바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한다. 맥머피는 로동형을 선고받고 작업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리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된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일인칭 서술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랫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인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린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친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유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한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한다. 저항했다가는 전기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페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사람이 되여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주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되여있는 것이다. 그들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보트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보트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애쓴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한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간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한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 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줄기 희망인 셈이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의 혁명적 변화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이다.
이 작품은 또 인물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에로의 귀의 등을 웨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세계적으로 루적 판매량이 1000만부를 넘어섰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여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