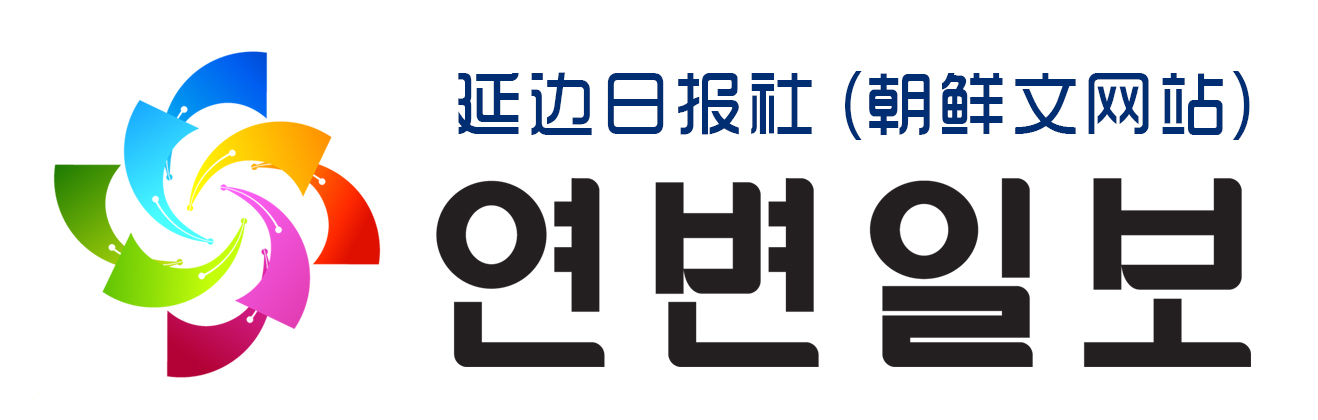사업단위 개혁, 매체 융합… 75세 연변일보는 여전히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속에서 13년차 기자는 펜의 무게를 더 절실히 느껴가고 있다.
내게 기자의 손에 들려진 펜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 첫 사건은 하도관리처 사업일군들에게 ‘멱살 잡힐 뻔’했던 일이다. 해빙기였던 초봄으로 기억한다. 퇴근길 우연히 부르하통하에 떠있는 쓰레기를 보았고 메고 있던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아 담당하고 있던 환경특집에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신문이 배포된 바로 그날 하도관리처에서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신문이 나가기 전날 하천 정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하도관리처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 현장에 불려나갔고 그 덕에 한동안은 하도관리처 관련 기사를 독점하다 싶이 다뤘다.
기자라면 다양한 립장의 견해를 두루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한 사건이 있다. 환경보호 전문 기자로 논두렁 태우기 단속 활동에 늘 동행했다. 그렇게 관련 부문의 시각으로, 환경보호의 각도로만 받아쓰기 하다 싶이 기사를 작성하다 동성용진 룡산촌에서 짚대 처리가 어려워 한쌍 되는 논의 경작을 포기한다는 어느 농민의 한탄을 들었다. 물론 나이, 지병 등 다른 리유들도 있었겠지만 짚대 처리에 드는 비용, 번거로움이 직접 경작 대신 땅을 양도하는 데 꽤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밭이든 논이든 태우지 않으면 일일이 들어가 밑단과 뿌리 부분을 파내야 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른다”, “짚대를 태우지 않으면 누가 돈을 주고 회수해가는가? 분쇄시켜 다시 밭에 내려면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여야 한다.”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무작정 ‘금지’만 외쳐댔던 내 글들을 회수하고 싶었다.
사전 조사가 부족해 ‘민페’를 끼친 적도 있다. 2019년 10월, 그해 한국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연변대학 조선언어학부의 최윤갑 교수를 인터뷰해 ‘겨레의 창’ 지면에 실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조문학부 초대 강좌장인 오봉협 선생의 외손녀였다. “저희 할아버지는 최윤갑 교수님의 스승이죠. 창립 초기 교수 물색, 교재 편찬, 학과 과정 설계부터 하셨구요. 돌아가신 지 70년도 더 되는 분이라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항의보다는 조곤조곤 설명의 어투로 말했지만 최윤갑 교수에게 <중국 조선어연구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을 씌워놓은 터라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실수를 조금이나마 모면하려 그 다음기 ‘겨레의 창’ 지면에 <연변대학의 첫 론문과 ‘기인’ 오봉협>이라는 글을 실었지만 가족의 감사 인사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불편했다.
언젠가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다. 원고를 교부함과 동시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편도 려행선에 내 글을 실어보낸 것 같다고… 기자 생활 10년이 넘어가니 그렇게 편집과 취재를 포함해 손끝을 흘러간 원고가 3000편에 가까워졌다. 내 펜이 남긴 것이 영원한 오점이 아닌 력사의 기록이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래본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