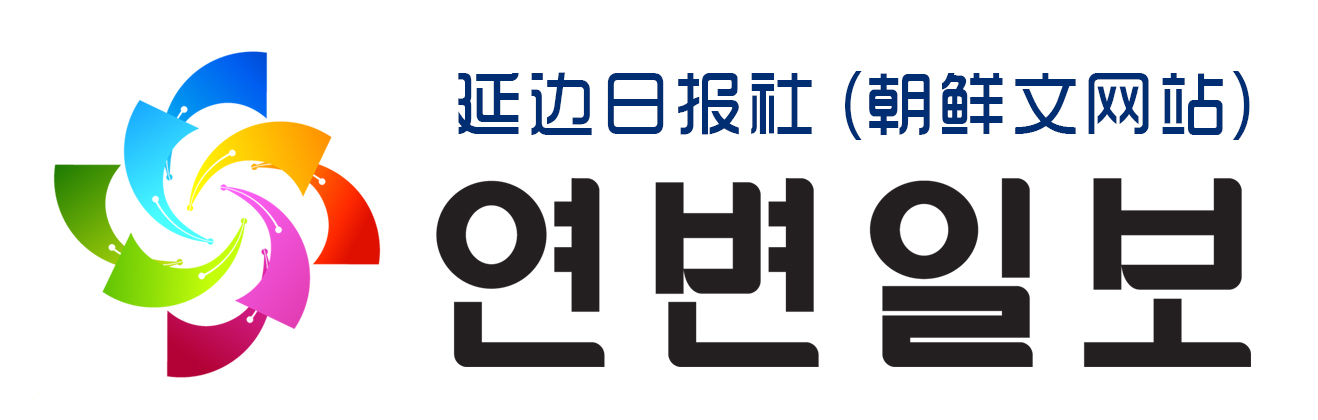가없이 푸른 하늘 아래 고요히 누워 있는 숲에 가본 적이 있는가. 기실 숲은 결코 고요하지 않다. 그 숲속에서는 토끼들이 먹이를 찾느라 뛰여다니고 그런 토끼들을 먹거리로 하는 새매들이 하늘을 빙빙 날아예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한시각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높은 나무우듬지에 둥지를 튼 새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큰 나무는 새들의 보금자리로 되는 것이다.
새들은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금자리만 지키는 새는 높은 하늘을 날아예는 오연함을 모르며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나래치는 푸른 꿈을 가질 수 없다.
몇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연변작가협회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귀가 번쩍 열리는 소식을 얻어듣게 되였다. 북경로신문학원에서 연변에 와 문학강습반을 조직한다는 것이였다. 문학에 흥취가 있었던 나는 일부러 북경에 가서 참가하지는 못할망정 문 앞에 와서 하는 강습반에는 꼭 참가하고 싶었다. 작가협회에 의향을 내비쳤더니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었다. 비록 강습생 인원수가 넘어나 방청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부가 달렸으나 그런 것 따위는 왕가물에 단비를 바라는 마음인 나한테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
드디여 개강일이 돌아왔다. 교실에 들어선 나는 깜짝 놀랐다. 글쎄 교실을 꽉 메우고 있는 학원생 대부분이 녀성들이였는데 그것도 대부분 4, 50대였던 것이다. 간혹 환갑을 훨씬 넘은 분들도 눈에 띄였다. 문학애호가들이 이토록 많다니? 그것도 녀성분들이 말이다.
그들은 첫날부터 열심히 강의를 듣고 부지런히 필기를 했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휴식시간만 되면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사이도 없이 그들한테 늘 포위되여있군 했다. 싸인을 받고 질문에 대답하느라 휴식시간은 그야말로 장마당이 따로 없었다. 수업이 시작된다고 소리쳐서야 다들 마지못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선생님들은 그제야 포위에서 벗어나 급히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다.
맨 뒤구석에 앉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부럽기도 하고 민망한 감도 들었다. 강사님들은 모두 중국에서 이름 있는 시인, 작가들이였다. 그런데도 철딱서니없이 어처구니없는 질문들을 들이대니 듣는 사람이 되려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였던 것이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도 유분수지.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슬그머니 그들의 뒤조사를 해보았다. 작품을 꽤 발표한 이름들도 한두명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전혀 못보던 이름들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신분이 그야말로 다양했고 평범했다. 서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보빌딩에서 신발을 파는 녀성도 있었고 브래지어장사군에 가정주부에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에 지어 농사를 짓는 농촌녀성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소설을 써서 연변의 중견작가로 성장한 머리 하얀 할머니 작가도 있어 더욱 놀라왔다.
아하, 이들 모두가 문학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구나!
며칠간 그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문학에 대한 그들의 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다시 그들의 신분을 알아보니 모두 작품을 몇편씩 발표한 사람들이였고 지어 문학상을 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순간 그들에 대한 나의 터무니없던 편견은 봄눈 녹듯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나처럼 문학의 길에 늦게 들어선 문학늦깎이들이였다. 어쩌면 그들은 삶의 무게 때문에 가족을 먹여살리는 일이 더 급한 것이여서 자신의 소중한 문학꿈을 접어야 했고 이제야 비로소 문학의 꿈을 펼칠 기회를 찾은 것은 아닐가. 그 순간 그들이 너무 위대해보였고 그 생기발랄한 문학꿈에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라도 보내주고 싶었다.
나중에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의 작품을 읽어보았다. 그들의 작품은 기성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추호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들도 있었고 중학생작문처럼 문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글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생활이야기에 각별히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들의 작품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작품에는 생활의 진실이 들어있었고 순수한 문학량심들의 짙은 호소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막언이나 위화 같은 대작가들의 작품만 작품이랴. 우리 민족이 걸어온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지고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의 이민사, 아버지 세대의 랑만과 애달픔이 반죽된 사랑이야기, 자신들의 쑥스러운 결혼이야기와 자식교양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감정으로 내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아빠트에서 살고 싶어 농촌에서부터 그 꿈을 위해 분투해 마침내 연길에 번듯한 아빠트를 장만했다는 이야기, 그 집을 사기 위해 거의 한생을 바친 허탈감에 결연히 붓을 들었다는 어느 녀성의 글을 읽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문학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녀성한테 경건해지는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었다.
력사는 학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놀래우는 이야기만 문학인 것은 결코 아니리라.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기쁨, 사회의 세포로 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생활사 역시 우리 시대가 엮고 있는 대하드라마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꿈이 있는 새들은 숲에만 안주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날개를 더욱 억세게 련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풍폭우 속에서 단련된 탄탄한 날개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세찬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생활의 숲을 벗어나 문학의 꿈을 향해 날개를 퍼득이는 새들이여, 더욱 오연히 창공을 나래치라! 그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들이다!
이번 강습에서 나의 오만과 편견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도 한마리의 꿈 있는 새가 되여 이들 속에서 높이 날고 싶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