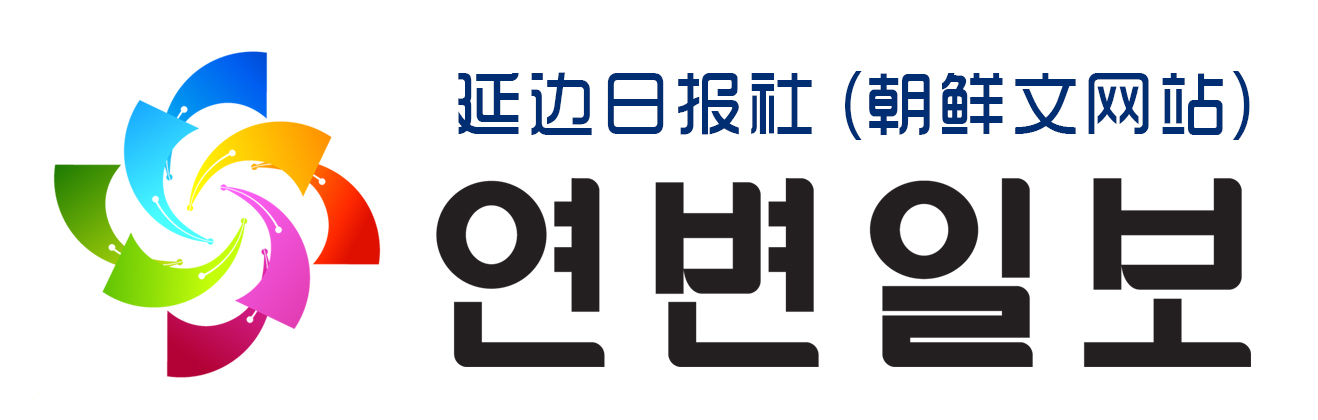길냥이는 많아도 내게 올 운명의 고양이는 첫눈에 알아본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어느 한여름 밤, 그날도 저녁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어구에 까만색 어린 고양이가 옹그리고 있었다. 머리가 조막만한 게 태여난 지 얼마 안되는 어린 고양이 같았다. 어스름한 땅거미가 깔렸는데도 나를 또렷이 올려다보는 그 호박색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났다. 마치 거기서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고 있은 듯, 웬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니 자리를 조금만 이동했을뿐 여전히 공손하게 엎드려있는 것이였다. 검은 고양이가 집에 찾아오면 집에 재부를 가져다준다던 말이 생각난 것은 내가 이미 고양이를 들어 품에 안은 뒤였다. 팔다리는 늘씬늘씬했고 네 발 모두 흰 장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흰색이 삼각으로 턱밑까지 이어진 턱시도 고양이였다. 그것은 따뜻하고 나른했으며 내 품에 폭 안겨들어왔다.
그즈음 나는 이미 장모종 친칠라 고양이 한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턱시도가 친칠라에게 좋은 친구가 되여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둘은 서로를 적대시했고 둘중 누군가 이불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나는 당연히 새식구인 턱시도의 짓이라 생각하고 늘 턱시도를 훈계했다.
친칠라를 비싸게 주고 안아올 때만 해도 나는 반려동물에게서 얻게 될 정서적 가치를 생각하며 한껏 들떠있었다. 하지만 친칠라는 나를 종으로 부려먹었을 뿐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긴 털을 사처에 널어놓았고 눈곱은 매일 내가 떼주어야 했으며 좀 안고 노닥거리려 하면 기회를 봐서 품에서 재빨리 달아나는 것이 정나미가 뚝뚝 떨어졌다. 정서적가치는커녕 괘씸함 그 자체였다. 오히려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치는 나의 곁에 와서 쉴 새 없이 목이 갈린 소리로 찢어지게 야옹거리면서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귀찮게 구는 게 일상이였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해서 살펴보면 털을 빗겨달라고 빗을 넣어둔 장롱 앞에 쫄래쫄래 걸어가서 빗을 턱질한다. 하참, 남은 고양이손도 빌어쓴다더만, 고양이손도 빌어쓰게 바쁜 나에게 걸리적거리기만 한다.
턱시도를 만난 뒤 나는 그 녀석이 내가 원했던 고양이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턱시도고양이는 일명 젖소고양이라고도 하며 중화전원묘의 일종이다. 턱시도는 작은 박스 속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기 좋아했고 핑크색 발바닥까지 늘 깨끗했으며 나의 가슴에 엎드려 자기 좋아했다. 잘 때는 아무리 건드려도 굳은 잠에서 깨나지 않았다. 나는 저으기 동심이 동해서 포대기에 그것을 싸서 안고 쌔감지처럼 놀기도 했다. 너무 날렵해서 집안을 날아다녔고 레이저빛 놀이를 할 때면 천정까지 뛰여올랐다. 몸이 무거운 친칠라는 그저 바닥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낳은 에미도 모를 표정으로 턱시도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였다. 턱시도는 가끔씩 그루밍을 하다가 소파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보스러운 반전매력도 있어서 나를 늘 웃게 해주었다.
그 후 나는 아빠트단지의 화원에서 턱시도와 비슷한 또래의 아기고양이 두셋을 더 만났다. 턱시도의 형제자매들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턱시도의 부모는 십중팔구 길냥이 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어느 봄에 만나 사랑을 하고 두달 뒤 어느 구석에서 턱시도를 낳았겠지.
친칠라는 애완동물번식산업이 발달한 심양의 어느 기지에서 태여났고 그들이 비싼 몸값을 매겨서 팔았다.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친칠라는, 내 새끼 같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약간 덜떨어졌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밥 먹자’라는 지령을 입력한 음성버튼 훈련을 일년 넘게 반복적으로 시켰는 데도 친칠라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누를 줄 모른다. 창가에 멍하니 앉아 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이다. 너무 애처로와서 안고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나를 사정없이 허비고 달아난다.
이렇듯 마음은 무료로 입양한 턱시도에게 확연히 기울었고 애정도 듬뿍 주었지만, 정작 농촌에 농가락식당을 꾸리는 지인이 창고에 쥐가 들끓어 고양이 입양을 수소문할 때 나는 뭔가 번쩍 뜨이는 것이 있어 고민하다가 턱시도를 지인한테 보냈다.
턱시도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였다. 드넓은 농촌마당에서 구애 없이 뛰놀 수 있는 자유와, 태여날 때부터 타고난 재간으로 쥐따위를 잡아제끼는 보람, 그곳에 보내는 것이 내가 길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운명의 고양이─턱시도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해서였다. 한편 줄곧 이불에 오줌을 싼 것이 못난 친칠라였다는 것은 턱시도를 시골에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실이 드러났다.
지인은 턱시도가 쥐를 잡는 영상을 가끔씩 나에게 보내준다. 쥐는 보기 징그러웠지만 턱시도는 름름했다. 어느새 어깨가 벌어졌고 킬러의 강인함이 표정에서 배여나왔다. 시원하게 부는 시골의 바람을 마주하고 수염을 휘날리는 턱시도는 제법 비장해보이기까지 했다. 따뜻하고 폭신한 침대와 영양배합이 잘된 사료는 없지만 대신 턱시도는 광활한 령역과 자기실현을 통한 가치를 얻었다. 그를 곁에 두고 정서적 동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나를 애짭짤하게 만들지만 그것 또한 인류의 일방적인 ‘착취’일 뿐이 아닐가.
아무렴 내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멍청한 꽃병 친칠라와 동반해 안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유를 벗 삼아 시골의 벌판을 거칠게 누비는 것이 턱시도에게는 가장 잘된 안배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내 자신을 위로해본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