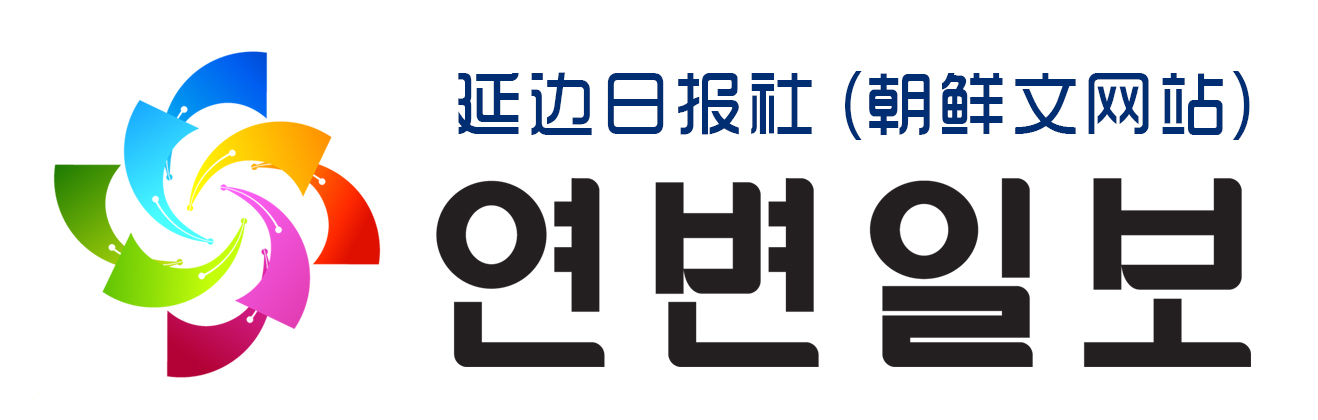백사장에 쳐올라오는
잔잔한 파도를 밟으면 알게 된다
사람이 첨벙첨벙 걷는다는 것을
물고기 다리가 없는 까닭을!
존재는 섭리 지워져있다
바다를 누르며 해가 들어가
해를 먹은 수평선은 부풀어올라
출렁출렁 넘쳐나는 바다
저녁노을 바다가에 서서
생각의 빈 잔에 하루를 담아
발걸음을 무겁게 잡는
파도의 허무 같은 거품에 쏟는다
밀어내는 파도를 벗어놓고
어스름이 저무는 먼 산에서
황혼을 벗겨 입고 한대 뽑아 물었다
하루 낮을 닫고 저녁을 켠다
푸른 침묵, 하얀 함성
바다를 씻어서 끝없이 씻어서
비누거품 륙지에 내다버린다
해변가는 바다의 쓰레기장─
파도처럼 가슴을 쏟고 싶다
먼 바다 우에 시선을 얹고
괴로운 속세를 잊어갈 때
긴 혀로 유혹하다가 멀리 뻗은
긴 입술로 발목을 무는 파도
푸른 침묵에 두렵게 빠지면서
하얀 함성에 정신이 깨여난다
오늘은 오늘로서 끝이다
마음 구석에 숨어있다가
불쑥 나타나 불쑥 찌르는 가시들
시간에게 더 시간을 줄 수 없다
폭발하면서 하얗게 터지는
파도를 가슴에 불러
금모래 은모래 일어내면
가시 박힌 마음을 널어놓으리라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사장도 없는 것을 알았으니
믿는다 슬픔의 끝은
슬픔이 아닌 것을 굳게 믿는다
새벽달
해를 기다리며
동쪽 하늘 건너다보고 있다
서천을 고독하게 지키며
새벽달 하염없다
먼 빛으로나마 꼭 만나보기를!
밤을 새워 창백한 달의 소원
미명의 고요 속에서 빌어준다
달이 발그므레 붉어진다
기다리던 해가 솟아온다
붉게 오는 아침으로 갈아입고
해와 달의 사이에 섰다
한 하늘 아래 그리움은
반드시 둥글어지는 것을!
앞에는 해, 뒤에는 달
둘의 상봉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 안에 둥글어 미소하는 너
옥수수밭에서
엄마등에 업혀있는 나를 본다
엄마등에서
나를 내리워 옷을 벗긴다
크면서 발버둥 배워
뒤로 빼는 몸을
꽁꽁 싸서 세워 업고
허리 휘청이며 가을까지 왔다
잔정이 잔걱정이
옥수수알보다 많은 가슴은
물기가 마르며 더 굳세여지고
하나둘 등에서 내려
허리를 펴게 되였을 때는
가볍게 떠나야 할 때
등에서 내린 자식 마음에 업혀
근심으로 여물어 무거워만 지고
몸은 헐거워져도
엄마는 살아서 홀가분한 적 없다
홍색랑자군극장
고속철을 타고 지나며 보았다
커다란 붉은 간판
─홍색랑자군극장!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놓고
목까지 돌려놓고 사라진
─홍색랑자군극장!
감동으로 먼 추억이 달려와서
그 시절을 달리고 있었다
그 시절을 지금도 달리고 있다
배가 고프고 예술도 고프던
그 시대 이 나라 마음을
온몸 펴서 가볍게 딛고
자국을 깊게 남긴 발레의 혼
내 동심의 백사장에서
가로 날고 세로 뛰고
활짝활짝 우로 차고 솟구치며
몸으로 황홀한 서정서를 쓴 시인
려족처녀를 보면 떠오른다
홍색랑자군 오청화
곳곳마다 피여있는 오청화
두 다리를 한일자로
어둠 뚫고 뻗어오는 무혼(舞魂)이여
서정의 숲
하늘을 받드는 열대소나무가
바다가에 떨군 그늘 한채
백만불짜리 바람이 불어
세상사 날려가고 마음 정토된다
어느새 뮤즈가 찾아와서
같이 령혼의 려행을 한다
작은 나를 그냥 앉혀놓고
자연이 되여 즐거운 큰 나
시삼백 사무사(诗三百 思无邪)
시삼백 사무사
공자님 말씀도 무색해지는 곳
령혼은 육신을 벗어버린다
서정의 숲이여, 서정의 뜰이여
정신의 땅에 삼가 들어가
해가루 걸치고 뿌리에 앉으면
나 여기 있어도 여기에 없어라
큰길은 문이 없다
령혼을 담은 그릇을 버리니
내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가벼운 것을!
<고향생각> 부르며
고향 생각하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네
─남쪽나라 수평선 우에
둥근달이 떠오르면…
둥근 꿈을 먼곳에 키웠다네
─젊은 병사 고향 그리워
야자수 부여잡고 노래 부르네…
전사시절엔 절절히 부르며
고향애를 첨으로 가슴에 담았다네
지금 야자수 쳐다보며 부르네
─내 사랑 있는 고향…
사랑이 있는 곳이 고향이 맞아라
고향 생각나게 하는 <고향생각>
<고향생각> 부르며 고향 생각하네
나그네길 애수의 친구
주:<고향생각>ㅡ50년대 연변가요 제목.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