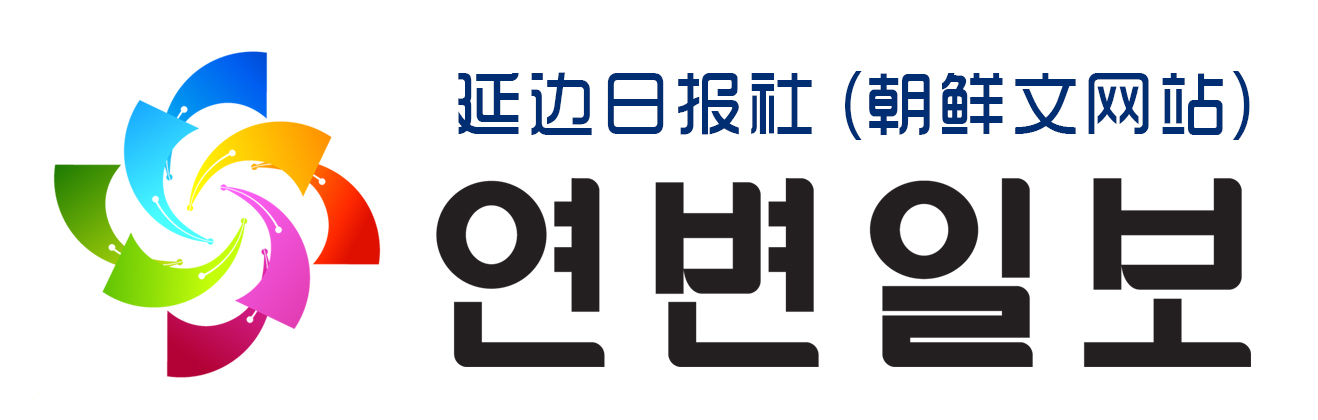강물이 흘러 땅이 갈라지고 다리가 놓여져 마을을 이어준다. 징검다리 이어 생겨난 듯한 어제날 남계촌 외나무다리, 그저 아름드리 백양나무 복판을 쪼개고 곁에 이깔나무를 덧붙여 보폭을 넓힌 수수한 시골의 외나무다리였건만 어린시절 엄마 따라 매일이다싶이 건너다녔던 아련한 추억 때문이랄가, 아직도 가끔 연집하 강뚝을 거니노라면 그 외나무다리가 눈앞에 선히 떠올를 때가 많다.
지난 70년도 초봄, 진눈까비 흩날리는 을씨년스런 어느 날이였다. 소형 삼륜자동차가 하방호인 우리 가족의 이사짐을 싣고 남계촌 동구 밖 강가에 이르렀다. 꽃샘추위로 성에장이 둥둥 뜬 시뿌연 강줄기는 시골의 평온을 깨뜨리고 감때사납게 출렁거렸다. 어떻게 건너지? 우리 가족들이 어쩔 바를 몰라 서성이던중 엄마가 먼저 저만치 먼 웃쪽켠에 외나무다리가 놓여있는 걸 발견하고 모두 차에서 내리자고 했다. 우리 일행은 한동안 서서 차가 무시로 부르릉부르릉 숨가쁜 소리를 내며 강폭의 거친 물살을 헤쳐 겨우 건너편 기슭에 당도하는 걸 보고 나서야 외나무다리 우에 올라섰다. 나는 처음 외나무다리를 걷는지라 좀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여럿이 외나무다리를 걷는 감각은 시가지 세멘트다리와 전혀 달랐다. 발을 옮길 적마다 몸이 좌우로 쏠리는 힘을 받아 삐꺽삐꺽 소리 내며 그네처럼 흔들거렸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춘하추동 이 위태로운 외나무다리를 넘나들며 낯선 농촌생활의 고달픔을 참고 견디기를 반복하는 행로를 걸었다. 그중에서도 온 가족의 뒤바라지를 도맡은 엄마의 중임은 누구보다 더 크고 무거웠다.
엄마는 쉰을 훌쩍 넘긴 녀인 같지 않게 얼굴색이 흰 데다 귀밑에 새치 한오리 없이 머리결이 함치르르하고 키도 훤칠하여 동네아줌마들이 미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언제 한번 크림을 사서 발라본 적 없이 가정살림에 돈을 쪼개 썼다. 엄마는 글을 몰랐다. 그러나 무엇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물정을 가늠하는 리치가 밝아 아버지는 엄마 말이라면 두 손 들고 찬성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매일 공사기관에 출근하다 보니 평소 집 안팎의 자질구레한 일은 죄다 엄마몫이였다. 밥 짓고 거두매하고 짬짬이 터밭 김을 매는 일외에도 한달에 두번씩 쌀 사러 외나무다리 건너편 공사마을 배급소를 다녀왔다.
엄마는 또 돼지치기를 너무 잘해 이웃들이 모두 와보고 혀를 내둘렀다. 한번은 흥안시장으로 장보러 간다며 아침 일찍 길 떠난 엄마가 땅거미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온집 식구들이 기다리다 못해 강녘에 나가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며 바장이는데 갑자기 낯익은 모습이 외나무다리 우에 불쑥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같이 “엄마다!” 하고 목청을 터뜨리며 집식구들이 우르르 다리목에 몰려섰다. 헌데 찬찬히 살펴보니 이상하게 외나무다리를 건너오는 엄마의 약간 휘우듬한 등 뒤에 쬐꼬만 꿀꿀이가 업혀있는 것이였다. 흥안시장에서 꿀꿀이를 사서 업고 15리 길을 걸어온 것이였다.
마당에 꿀꿀이를 내려놓고 보니 모양새가 억이 막히게 흉물스러웠다. 갈비뼈가 아른아른할 정도로 바싹 여윈 데다 등골이며 배가죽이며가 비루먹어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다. 집식구들은 모두 낯을 찡그렸는데 엄마만은 아니였다. 뒤다리 길고 등허리 늘씬하게 생긴 건 이제 품을 들이면 영낙없이 잘 커갈 거란다. 엄마는 땅바닥이 차겁다고 짚을 깔아주고 끼니마다 죽을 뜨끈뜨끈하게 끓여 그릇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석유를 하루 몇번씩 상처자국에 발라주며 보살폈다. 한동안 집식구들은 그저 설마하고 지켜봤는데 기적은 보름 후에 나타났다. 비실비실해 전혀 가망이 없어보이던 꿀꿀이가 때벗이를 하면서 부스럼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몸뚱이에 벌써 살이 올라 번질번질 윤기 돌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엄마는 꿀꿀이를 안아 아버지가 갖 손질해놓은 우리에 넣었다. 그러고도 혹시 돼지우리 북쪽 변두리로 찬바람이 들어갈가봐 싸리나무단을 촘촘히 세워 두텁게 만들어놓았다.
돼지는 비름, 능쟁이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래서 엄마는 매일 외나무다리를 넘나들며 풀을 뜯어다가 김이 물물 나게 푹 삶아주었다. 그리고 짬짬이 나무꼬챙이로 돼지몸뚱이를 슬슬 긁어주었다. 그러면 돼지는 금방 뼈마디가 뿌드득 늘어날 양으로 쭈욱 기지개 펴며 흉물스럽게 뚱뚱한 배를 드러내고 척 누워버렸다. 그렇게 정성스레 키운 돼지를 팔아 40원짜리 반도체라지오를 사온 날, 온집 식구들은 기쁨에 겨워 밤 깊도록 떠들썩했다.
엄마는 여러 자식을 하나같이 끔찍이 아꼈다. 겨울철 형님이 땔나무를 가득 해서 뜨락에 무져 놓았는데도 엄마는 고생스럽게 마련한 자식의 로고를 덜어주느라 겨울의 맵짠 추위를 무릅쓰고 외나무다리를 건너 담배밭 담배대를 검질하여 등짐으로 날랐다. 마른 담배대는 이글이글한 장작불과 달리 아궁에 집어넣기 바쁘게 확 붙었다가 훅 꺼져버려 땔손이 헤펐다. 땀 흘리며 한아름씩 등짐에 지고 와도 두끼 밥을 끓이기엔 좀 반지빨라서 엄마는 틈이 생긴 대로 담배밭을 자주 찾아다녔다. 한번은 엄마가 담배대를 짊어지고 귀가하던 도중 외나무다리에서 발목을 접질러 하마트면 큰일 칠 번했다. 그 후부터 내가 엄마를 도와 종종 땔감 마련에 동참했다. 엄마는 나더러 그루터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밭고랑 사이에 바오래기를 두줄로 간격 두고 펴놓은 다음 담배대를 하나하나씩 베여 그 우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엄마는 일솜씨가 재빨라 내가 한단을 채우기도 전에 벌써 두번째 단을 묶었다. 서툴고 무맥한 내 일재간을 두고 엄마는 시무룩이 웃으며 “우리 집 막내아들은 농촌에 있지 말고 시가지에 가 살아야겠는데…” 하고 나의 연약함을 어루쓸어주었다.
연집하의 흐름은 심술궂게 변덕이 많았다. 한겨울엔 두터운 얼음층이 강판을 뒤덮어버리는가 하면 삼복철엔 강바닥이 바싹 말라 소오줌을 방불케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혹한과 폭염의 시달림을 이기지 못해 외나무다리는 군데군데 파이고 찌든 채 뿌옇게 퇴색했다.
자연의 섭리는 어길 수가 없어서 언제부턴가 엄마도 어제오늘 다르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앞에서 자꾸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검은 물체가 흔들린다더니 밤중에 놀라 깨여나 누군가 바깥문을 두드리며 괴성을 지른다고 했다. 고혈압에 환각증세가 겹쳐 인차 낡은 집터를 떠나 생산대에서 지어준 새집에 이사했는 데도 병세는 차도를 보일 대신 점점 심해졌다. 한밤중에 엄마의 앓음소리를 들을 때면 온집 식구들은 불안에 떨었다. 무작정 의사집에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사흘이 멀다 하게 오르내리는 엄마의 고혈압 병을 눅잦힐 대책이 별로 없어 온집 식구들은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 헤맸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근들이술을 사다 놓고 의사를 모셔올 적마다 배추김치에다 한두잔 따라올리며 송구함을 표했다.
하루는 찔끔찔끔 내리던 비가 저녁무렵 한꺼번에 콱 쏟아지는 장대비로 변해 온 동네가 물판에 잠겼다. 헌데 글쎄 엄마가 돌연히 또 앓아누울 줄이야. 진창길을 첨벙첨벙 달려가 의사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어 모셔왔다. 그날 따라 어쩐지 의사가 혈압을 재고 맥을 짚어보더니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빨리 차를 구해 연변병원으로 떠나라는 것이였다. 아버지가 부리나케 위생소로 달려가 강 건너편 연변정신료양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마을청년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담가를 만들어 혼수상태에 이른 엄마를 강녘으로 운송했다. 하지만 강가에 이르렀을 때 눈앞의 광경에 모두 멍해졌다. 구급차는 이미 강 건너편에 도착한 상태였으나 불어난 물로 건너올 념을 못했고 외나무다리마저 가장 요긴한 상태에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없었다. 시커먼 홍수가 무섭게 강기슭을 핥으며 룡트림했다.
내가 조급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빨리 강물에 들어서기오!” 하고 소리쳤다. 난 아직 어려서 끼여들 엄두를 못냈고 형님을 비롯한 마을청년들이 옷을 입은 채로 첨벙첨벙 물속에 들어섰다.
잠간 사이에 물은 허리를 쳤다. 쏴— 소리와 더불어 물살은 사정없이 담가를 멘 청년들의 몸뚱이를 후려쳤다.
‘아, 엄마 죽으면 안돼!’
갑자기 이런 무서운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쳤다. 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장한 순간을 보다 말고 울컥 설음이 북받쳤다. 가슴벽을 물어뜯는 슬픔을 꾹 누르려고 얼굴에 후둑후둑 떨어지는 비방울을 손등으로 쓱 문질렀으나 소리없는 울음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들쑤셨다.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고 집에 돌아온 나는 납덩어리처럼 굳어진 집안 분위기가 싫어 곧장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다. 현재 엄마는 어떻게 됐을가, 태산 같은 근심에 짓눌려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어쩐지 엄마가 완쾌하여 집으로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뻐스시간대를 맞춰 강녘에 나갔다. 홍수가 떠난 강물은 언제 그랬냐싶게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고 외나무다리도 다시 제 위치를 찾아 덩그렇게 놓여있었다. 나는 외나무다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제나저제나 하며 엄마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내 예감은 정말 맞아떨어졌다. 점심 즈음 학수고대하던 엄마가 강녘에 나타났다. 아버지가 짐을 들고 엄마는 한발짝 떨어져 천천히 걸어왔다. 외나무다리를 건너오는 엄마의 얼굴은 약독이 올라 푸석푸석했고 유난히 꺼진 눈확이며 가냘프게 떠는 어깨를 보아 며칠 동안 엄마가 병마의 시달림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한달음에 뛰여가 “엄마!” 하고 불렀다.
“그래, 엄마가 죽는 줄 알고 막내아들이 무척 놀랐겠다. 응?” 내곁에 다가선 엄마는 의외로 넌지시 롱담를 건넸다. 나는 “네” 하고 말할 대신 뜻밖에 “아니요” 하고 몸을 비틀며 왕청 같은 대답을 했다. 그때 나는 왜 엄마 손을 어루쓸며 “엄마, 다시는 앓지 마!” 하고 진지하게 감정표달을 할 줄 몰랐을가. 그런 나 자신이 나중에는 바보처럼 여겨져 미웠다.
그나저나 나는 신나서 껑충껑충 뛰였다. 나한테는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이 제일 기뻤으니깐. 그날 따라 파아란 하늘에 피여난 구름송이도, 날개짓하며 자유를 즐기는 메새들의 지저귐소리도 그처럼 정답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라의 정책에 의해 우리 집 식구들이 다시 도시로 올라오던 날 엄마는 마치 고생살이로 얽히고설킨 남계촌을 떠나기 싫은 듯 일부러 외나무다리 우에 서서 마을정경을 이윽토록 바라보며 눈굽을 찍었다.
코로나가 끝난 지난해 추석날, 엄마 산소에 코스모스꽃이 곱게 피여있었다. 분명 저세상에서 엄마가 자식들에게 보내는 웃음이였다. 성묘가 끝난 뒤 형님과 나는 일부러 엄마가 고생한 남계촌 옛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해보니 그사이 천지개벽인 양 몰라보게 변했다. 옛집터엔 별장 같은 큼직한 양로원 건물이 들어섰고 강녘에는 외나무다리 대신 널직한 콩크리트다리가 보기 좋게 척 걸려있었다.
형제간이 한창 긴가민가 옛 추억을 더듬을 때 마을쪽에서 로인들을 태운 관광뻐스 한대가 미끄러지듯 서서히 다리 우에 올라섰다. 차안의 로인들은 마냥 즐거워 웃으며 떠들며 야단법석했다. 옛날엔 꿈도 못꾼 명승지관광을 떠나는 모양이였다. 하긴 극장가, 료리집을 다니는 일이 인젠 로인들한테 례상사로 되였으니 복받은 로인들의 생활이 그대로 노래이고 춤인가 싶었다.
‘아, 지금 로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문득 나는 엄마생각이 났다. 엄마한테는 지금 로인들 같은 행운이 없었다. 명절이 띄여도 언제 한번 색다른 음식, 변변한 옷가지조차 받아본 적 없었다. 바람 부나 비 오나 그저 유일한 생활의 길목인 외나무리를 매일 힘겹게 건너다닌 엄마의 그림자가 문득 소연히 흐르는 저 강물에 비껴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난에 패이고 찌그러진 남계촌 외나무다리와 멋진 풍경선을 이룬 콩크리트다리가 너무 대조적인 격차를 보여 나는 세찬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오, 남계촌 외나무다리여!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