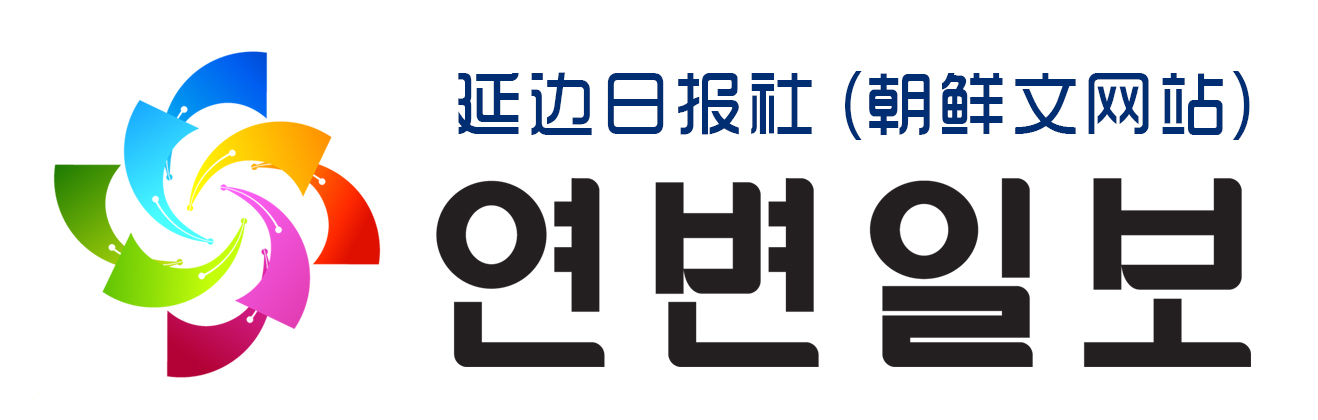저 하늘 뭉게구름 떠다 놓은 듯
이팝꽃이 하얗게 피였습니다
길가의 가로수에도
인적 드문 산길에도
누가 두고 간 고봉밥처럼
이팝꽃이 피였습니다
배고프다 떼쓰던
자지러진 내 울음소리
이팝 속에 숨었나
자식들 배 곯을가
간밤에도 이팝나무
흰 쌀밥 고봉으로 지었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수북수북 얹어놓고 가셨습니다
붓
붓이여,
한번 휘날리면
학이 되여 날아예네
압록강 두만강 아우르며
하늘 높이
훨, 훨, 훨
붓이여,
다시한번 휘날리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신명 나게 상모 돌리며 춤을 추네
흰옷 입은 누이들
덩실덩실 더덩실
붓이여,
버선발 살포시 들어올리면
쑥꾹쑥꾹 쑥꾹새 울어예는
청산의 머루랑 다래랑 함께
온 누리에 빛나리
똬리
흰옷 입은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장백산 아래 집 짓고
터전 이뤘다
똬리처럼 단단하게 살라
가르쳤다
인정 많던 아낙들
똬리 튼 머리 우에
서리서리 얹힌 물동이
하늘을 받쳐 이고
한생 꿋꿋이 살다 갔다
엄마도 그러했다
가을비
가을비가 추적추적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나 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가을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물이 수정처럼
눈가에 맺혔습니다
오늘도 나는
가을비속에 덩그러니 섰습니다
다시 못 올 그 사람이
가을비가 되여
나를 어루쓸어줍니다
가을에는
눈물처럼 뜨거운
단풍잎에 비가 옵니다
산딸기
산신령님께서
두고 가셨나
저 이쁜 루비 반지를
울 엄마 무덤가에서
붉게 웃으며
주인을 기다리네
험한 일에 지쳐
굵어진 손마디에
반지는 사치였을가
오늘은
저 루비 반지 가져다가
울 엄마 끼워 드려야지
자화상
삼신할매 점지해주십사
9년 치성 끝에 낳았다는 나
늪 속에서 건져낸 큰 항아리가
유난히 빛났다던 엄마의 태몽
달도 별도 캄캄했던 유년은
세상의 내 것은 없었다
또래 사내애들 놀다 버린
딱지, 차곡차곡 펼쳐
공책으로 쓰고 지우고 또 썼다
돌이켜보면
그런대로 살맛 나는 먼 려행길
지금 나는 덜컹거리는
소달구지에 나를 싣고
먼 려행길 떠났다
마른 하늘에 번개 치듯
행간을 건너가는
고독한 성찰의 길
저녁 해살이 길을 재촉한다
저기 붉은 노을이 타는 듯 웃어준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