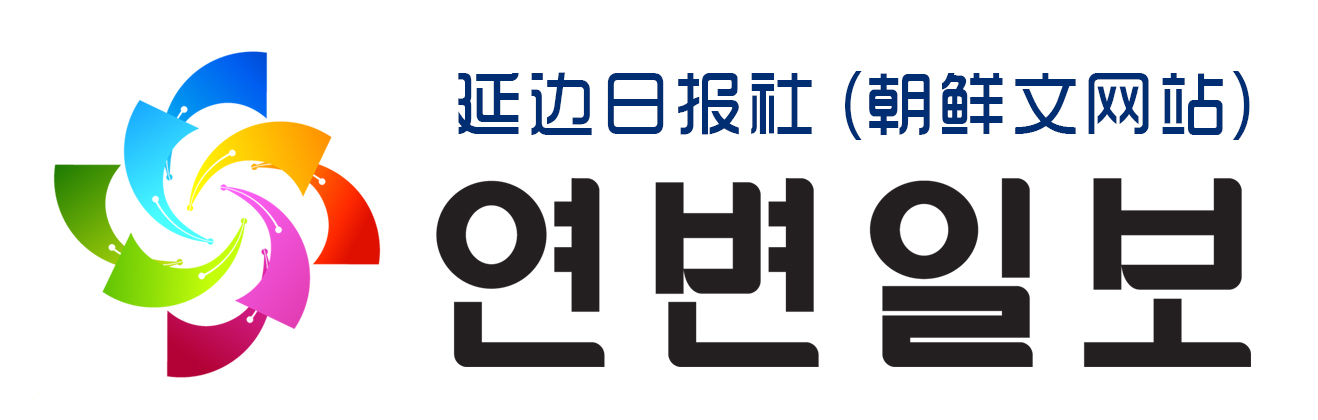나는 종종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각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엔 화장실에 가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버릇이 있다.
손을 씻다가 거울을 쳐다보니 거기엔 망연한 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대야가 보인다. 핑크색 대야랑, 어두운 청색의 대야이다. 하나는 전문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 깨끗한 대야, 다른 하나는 전문 발을 담글 때 쓰는 대야이다. 색갈이 다를 뿐인데 운명이 이토록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니. 물론 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지만 마음이 아련해진다.
저 청색의 대야는 매일 핑크색 대야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또 저녁마다 나의 충실한 ‘발 담그기’ 대야로 되여주는데 내가 원망스럽지 않을가? 색갈이 달랐을 뿐인데, 무늬가 달랐을 뿐인데, 그들의 주인인 ‘나’란 인간이 핑크를 더 좋아했단 리유로 하나는 때물을 담고 있고 하나는 비누향을 담고 있다.
태초에 저 대야는 때물을 담고 싶었을가? 절대 아닐 것이다. 내가 만약 저 대야였다고 해도 향긋한 샴푸향 속에 머리를 씻겨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담지 않은 채 대야 그 자체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의 윤택 그대로, 대야에 그려진 패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새것 그대로의 대야, 가격표를 붙이고 마트의 진렬장에 얹힌 팔리지 않은 대야. 왜 꼭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가? 대야로 태여난 운명이란 꼭 무언가를 담아야 한다면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은 나는 어디에 가야 할가?
내가 오늘 뭘 담든 평생 뭘 담든 뭐가 다를가? 향을 먹고 사는 거랑 더러운 물 먹고 사는 것 차이 정도라면 내 생각이 바뀔가? 그런데 향이란 무엇이고 흙물이란 무엇인가? 나는 진짜 꽃의 향 말고는 향수도 싫고 화학물질이 들어간 일체 인조향이 싫은데 그런 향이 난다고 한들 흙물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가?
또 그렇다고 누군가의 발을 씻은 물을 온몸에 적시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나란 대야는 한집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가.
가출이 제일 좋겠다. 아니, 가출이라기보다는 될수록 ‘려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막에 버려지는 건 어떨가? 인간의 가짜 향과 멀리할 수 있고 그 짜증 나는 발냄새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담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힘들게 뭘 담고 있지 않아도 되겠으니 진정 자유의 몸이 아닐가. 그 대신 퍽퍽한 모래가 있고 징그러운 벌레가 있으며 물도 없고 땡볕더위와 엄동설한을 나 홀로 견뎌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담지 않으니,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으니 크나큰 사막에서 정착할 곳도 없을 것이다. 자다가도 바람이 불면 휩쓸려 떠나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있을 테지만 그런 환경에서 혈혈단신에게 무슨 힘이 있을가? 아무것도 담지 않으려 했으니 가벼운 몸인 대야는 바람에 따라 떠도는 신세밖에 더 있을가?
버려지지 말아야겠다.
자유로운 자유는 없는 것이다.
무언가를 담아야겠다.
고중 때 정치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누어주셨는데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여서 제꺽 책에서 답안을 찾아서 쓰고는 피곤하여 엎드린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로 다가와 나의 시험지를 보시더니 해주셨던 한마디가 생각난다.
“작은 그릇이 되지 말고 큰 그릇이 되여야 해.”
큰 그릇이 되여 뭘 담을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때 선생님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다.
어릴 적 배운 문장이 떠오른다. 너무 어릴 때 배운 것이라서 기억이 어렴풋하다.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그리고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다. 고추장 항아리는 고추장을 담고 있어서, 된장 항아리는 된장을 담고 있어서, 간장은 간장을 담고 있어서 자랑스러워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서 홀로 슬퍼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을 때 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로 바람이 왔고 달이 왔다. 그들은 항아리에게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제야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도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때는 그냥 읽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읽었었는데 이토록 무덤덤하게 스쳐지났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올 줄이야. 항아리도 그렇듯이 인간도 무언가를 담고 싶어하는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찾으면 꼭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위로의 이야기이다.
만사에 귀찮은 요즘, 사실은 귀찮아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진정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 거다. 도대체 나는 무얼 담고 싶은 것일가? 순간 그날 밤 항아리에게로 와준 달빛과 바람보다는 금이 간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던 할머니가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할머니가 그 금이 간 항아리를 던졌더라면, 만약 그 금이 간 항아리가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를 떠나 홀로 남게 되였다면… 그날 밤처럼 맑고 깨끗한 바람과 달님이 찾아왔을가?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도 이 세상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꼭 존재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이다. 이제 나는 또 빈 항아리가 되였다. 비여있으니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것이다. 나는 꼭 의미 있는 것을 담고야 말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