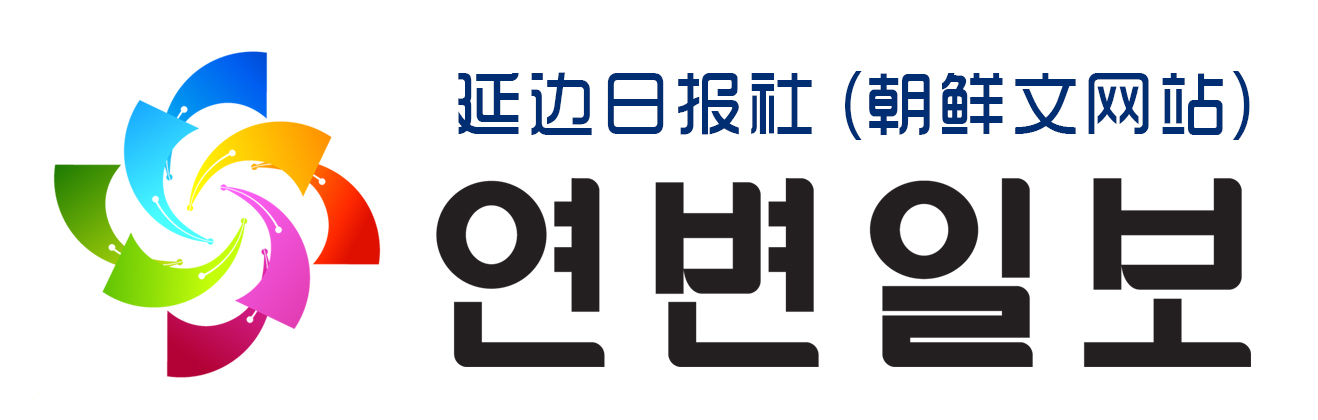뜻하지 않게 호텔에서 한주 동안 격리생활을 했었다. 닷새가 되던 날 문득 벌써 5일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의외로 빨리 지났다. 시간을 단위로 계산한다면 만 99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집에서 떠날 때 헤여지기 아쉬워 눈물로 량볼을 적시는 딸애에게 시간 계산을 24(시)×30(일)=720시간에서 자는 시간 절반 빼면 360시간이라고 알려줬던 것이 어쩌면 처음 딸애 곁을 떠나는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4분의 1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앞에 밀페된 공간에서 외출이 금지된 이상 창문을 열고 통풍할 때 길옆이라 소음이 대단한 것외에는 나름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일에 치이고 육아에 허덕이면서 지치고 힘들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일상탈출을 꿈꿔왔다. 그런데 의외로 핸드폰도 없이 외계와 단절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니…
간만에 낮잠도 푹 자고 초저녁부터 일찍 취침하는가 하면 애매한 리모콘만 못살게 굴며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다가 읽던 책을 마저 읽은 것이 고작 한권인데 벌써 5일이 지났다.
신기한 건 때에 맞춰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다. 전혀 에너지 소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 구석구석에서 세포들은 자기 일에 바쁘다. 신진대사는 여전히 진행중이였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여는가 하면 평소 관심 없던 물도 자주 마시고 저녁마다 얼굴에 팩도 하고 하면서 나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다.
래일이면 호텔을 탈출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자가검진 체온측정이 하루의 필수코스였는데 래일부로 이미 지나간 옛말이 될 것임으로 말이다.
문득 우리에게 힘든 건 격리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격리’가 아닌가 싶다. 전에 우리 아빠트단지가 통채로 격리상태가 된 적이 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했으므로 활동범주가 아빠트내에 국한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자꾸만 외출을 감행하고 싶어졌다. 일명 탈출을 말이다. 금지구역으로 표시된 흰줄 밖의 저 땅을 잠시 잠간이라도 밟고 싶다는 충동이 스멀스멀 솟구치는 건 무엇 때문일가?
살면서 우리는 피치못하게 이런저런 ‘격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 높게 세워진 내 마음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나만의 세상에 머물러 우물 안의 개구리가 따로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치로 판단을 서슴지 않는다. 견해의 차이가 아닌, 나는 언제나 맞고 상대는 언제나 틀렸다.
꼬치를 엄청 즐기던 내가 임신기간에는 아예 한입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거부했는가 하면 양파라면 질색하던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반찬에 곁들인 양파마저도 서슴없이 골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다지도 맛있는 양파를 거부했을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또 치마라면 결혼 때 잠간 한복을 입은 것이 고작이였으나 3년 전부터는 치마만을 고집한다.
사람은 변한다. 아니 어쩌면 변한 건 사람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때는 아니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이 지금은 옳은가 하면 그때는 맞다고 여기던 것이 지금은 결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생각과 사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거듭되는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사유의 폭이 넓혀지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격리’의 과정들을 번복하군 한다. 보이는 격리와 보이지 않는 격리, 그 한끝의 차이는 미세할지 모르나 결코 미소하지 않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찰해내는 센스로 어떤 격리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우리의 매 순간이 좀더 아름다움으로 또 다른 풍경을 선물해주지 않을가.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