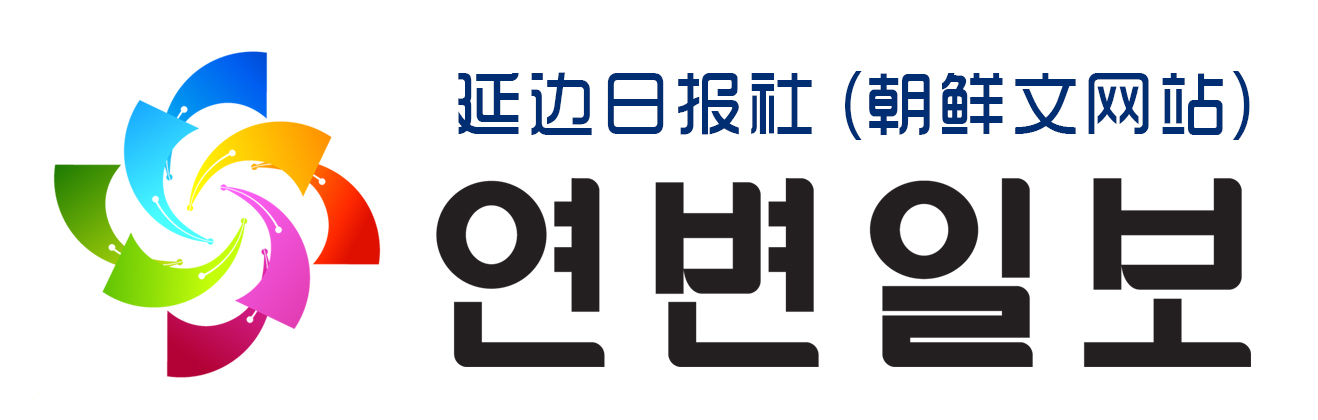발걸음이 무겁다. 일흔 겨울을 넘긴 아버지가 연변 고향의 흙냄새가 묻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르하통하가 훤히 바라보이는 연신교역에 내렸다.
“이제 좀 쉬여야지.”
자식들의 말을 뒤로 하고 아버지는 강바람이 스치는 작은 집 한채를 택했다. 조선족 민박집 ‘미향민박’ 간판이 흔들린다. 말 그대로 아름답고 향긋한 냄새라는 의미를 지닌 간판이였다. 하얀 머리칼과 빨간 간판이 어울리지 않게도 생경하다.
문을 여는 소리가 익숙지 않다. 평생 가족을 위하여 일해오신 손, 이제는 손님의 짐을 들어줘야 한다. 방문 손잡이는 아버지의 굳은살 박힌 손보다 더 차겁게 느껴진다.
“어서 오소, 손님!”
아직도 고향 사투리가 묻어나는 인사말이 툭 튀여나온다.
아버지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부끄러움인지 긴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아침해가 뜨기도 전, 부엌에서는 이미 뚝배기와 남비가 부딪친다. 어머니가 손수 해온 메밀가루로 국수를 뽑고 시래기를 넣어 푹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동네를 휘감는다.
“우리 고향 맛이여… 손님들 입에 맞을가?”
아버지의 속삭임에 메밀가루 봉지가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손님들 앞에 내놓는 반찬 접시엔 동북3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제 장아찌가 자리잡는다. 그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고집이다.
손님들은 궁금해한다.
“아저씨, 여기서 태여나셨어요?”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백산 너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가끔은 한어 단어가 섞여나오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두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속에서 살아온 이만의 정겨움이 스민다. 젊은 조선족 관광객이 찾아오면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인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도 연길에서 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주름살이 꽃을 피운다. 고향말로 주고받는 대화는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듯한 온기로 가득하다.
저녁이면 작은 마당에 둥글게 모인다. 아버지는 꺼내놓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선족 민요 한 소절을 흥얼거린다.
“장백산 아래 우리 고향~”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가슴속 정은 선명하다. 손님들이 따라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는 혼자서 그 노래를 끝까지 잇는다. 마치 산 넘고 강 건너 이곳까지 이어온 자신의 인생을 되새기듯.
손자 녀석이 와선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사업 시작해요?”
아버지는 간판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게 할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란다. 얘야. 꺼지기 전에 좀 반짝여봐야지.”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다.
‘미향민박’ 문턱을 넘는 발소리가 점점 잦아진다. 붉게 익어가는 백일홍 아래, 아버지는 이제 손님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한족식 감자탕과 조선족식 감자탕의 차이를 설명하며 “중요한 건 국물 속에 스며든 정이여!”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에서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이 땅에 뿌리내리려는 의지가 교차한다.
일흔이 넘어 새로 연 문은 편히 쉬기 위한 문이 아니다. 흩어진 정을 다시 주어 모으는 작업장이다. 아버지의 민박집은 단지 잠자리를 파는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 흰머리로 증명해내는 작은 우주이다.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흘러나오는 소리는 쉼표 없이 이어져온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알려준다. 아버지의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산책길 우에 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