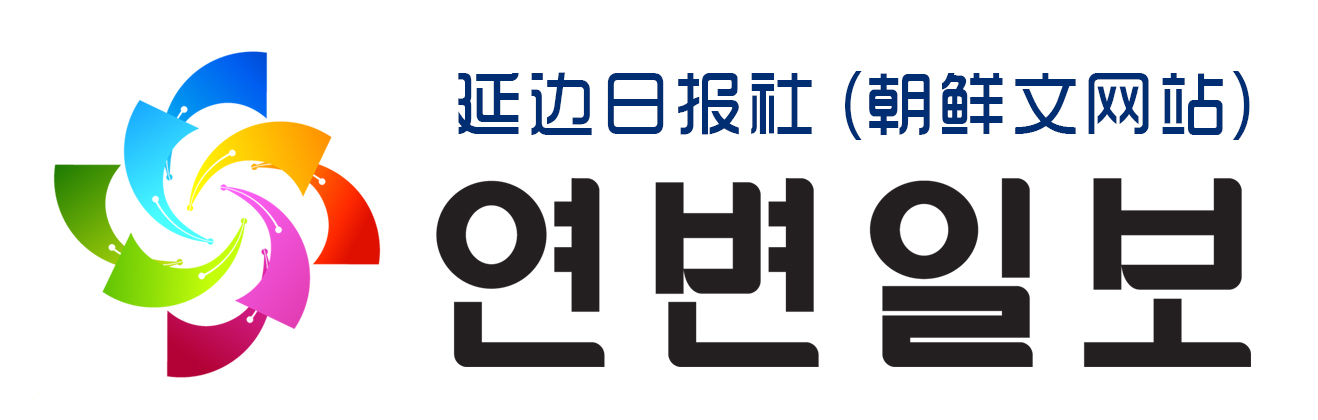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한폭의 담백한 수묵화이다. 피리소리에 실려오는 향촌의 아늑한 풍경이다.
산과 물 사이에 오붓한 촌락이 앉아있다. 황혼무렵 땅거미 속에서 뜰의 닭도 개울의 오리도 일밭에서 돌아오는 주인 꽁무니를 따라 집을 찾는다.
더 말해 무엇하랴. 저녁밥 지어놓고 아이를 부르는 다정스런 어머니의 부름소리도 있으리라.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드는 평화와 사랑으로 질서 정연한 도화선경이다. 이 질서를 이끄는 산그림자는 자연의 시계이다.’(시<산그늘>)
한번 일본 동경으로 갔을 때 저녁 무렵 구역 방송에서 이렇게 들려왔다.
ㅡ밖에서 놀고 있는 꼬마친구들 저녁식사시간이 되였어요.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며 인정미 넘치는 도시 동경을 맘속으로 찬탄했었다.
그런데 우의 시를 읽으며 그 이상으로 마음 끌리웠다. 자연을 잃은 동경은 하는 수 없이 전파로 그 결함을 메우려고 애쓰건만 그 어찌 자연의 륜리에 비하랴. 자연이야말로 시시각각 말없이 자신의 특수한 언어로 이 세상 생명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시에 실린 산은 태산의 웅위로움도 없고 화산의 험준함도 아니고 형산의 수려함도 찾아볼 수 없고 항산의 기이함과도 멀고 숭산의 준수함과도 겨루지 못한다. 이 강산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수한 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시인은 이 시에서 무엇을 찬미했을가.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법칙을 제시했을가?
그럴 리 없다. 그것은 과학이다. 과학은 지식을 준다. 시는 판판 달리 사람에게 정감을 준다. 사랑을 준다.
흔히 아버지의 사랑은 산으로 비유된다. 아버지는 산처럼 묵묵히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시인의 시에도 가수들의 노래에도 나오기 싫어하는 말이 없는 존재이다. 이런 수천수만의 아버지가 인간세상을 영위해나가는 데 이바지한다. 시인의 잠재의식은 잊지 못할 아버지의 사랑에 젖어있었으리라.
이 시의 언어는 더 평범할 수 없이 평범하다. 평범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평범한 말에 깊은 감정을 담아야 그 생명력이 강하다. 남녀로소 즐겨 부르는 만남의 환락과 리별의 슬픔을 담은 <아리랑>, 덧없는 세월 애탄하는 <노들강변>, 자연에 어울려 삶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정을 담은 <도라지> 등은 담백한 가사로 소박한 가락으로 영원히 불려지리라 믿는다.
담백한 풍경화를 그려주는 <산그늘>도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가고 여겨 마지 않는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