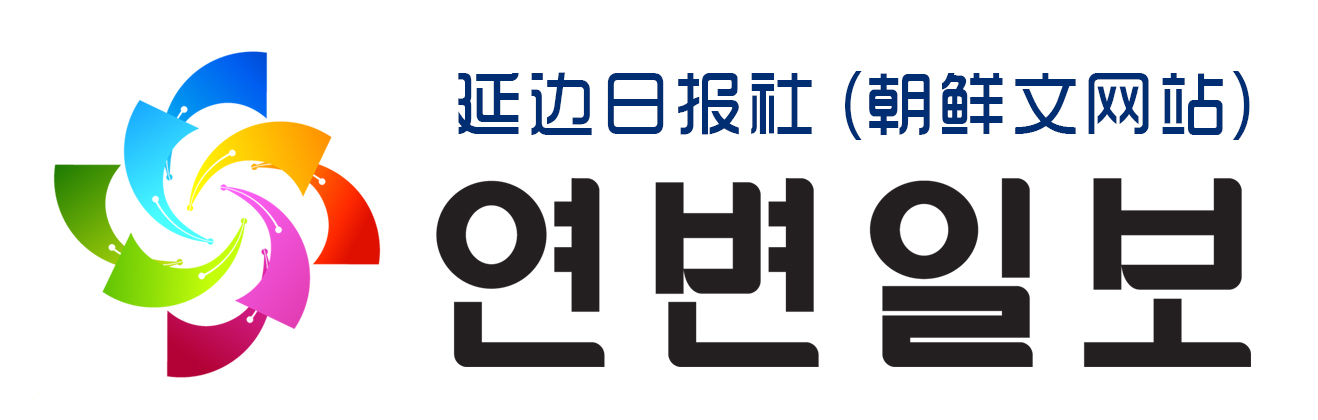내가 좋아하는 빵집은 매일 5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 한주에 한번씩 주문하는데 퇴근시간에 맞춰서 주문하면 집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다.
그날도 나는 명심해서 5시에 위챗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주문을 넣었다. 그런데 이슥해서야 한어로 “음성으로 보내거나, 한어로 주문을 다시 적어주세요.”하는 것이였다. 조선족 주인장이 자리를 비워서 점원이 위챗으로 주문을 받겠구나 하고 짐작하고 다시 주문을 넣었는데 내가 주문한 빵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고 “우리 가게는 크랜베리베이글이 맛있어요.”하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징어먹물베이글로 주세요.”하고 말했는데 이윽토록 말이 없더니 다섯시 반이 되자 “미안합니다. 퇴근했어요. 래일 다시 주문하세요.”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장이 돌아왔다.
화가 치밀어 풀떡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차단 삭제하고 싶었지만 이 몹쓸 식탐과 인간의 요사스런 심리는 더욱 간절히, 오로지 그 빵집의 베이글을 원하는 바람에 그저 바보처럼 화를 눅잦히는 수밖에 없었다.
‘점원이잖아, 주인장이 아니고.’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시키니 그나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도 나처럼 너그러운 고객이니 망정이지.
점원 때문에 기분이 잡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옷가게에 가서도 조용히 구경하고 싶건만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이게 이뻐요.” 하면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만 전문 골라서 추천하지 않나, 남편 옷을 고르는데 “그건 남자옷인데요, 녀자 코너는 이쪽입니다.” 하면서 눈치 없이 안내하지 않나, 저 옷 좀 보자고 하면 나를 아래우로 훑어보면서 “안 들어갈 거예요.”라는 따위의 찬물을 뒤집어쓴 경험 따위는 녀자라면 한두번씩 있을 것이다.
음식점에서 가장 리해되지 않는 것은,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마치면 점원들이 지체할세라 메뉴판을 가져가는 것이다. 좀 천천히 보면서 가장 맛있어보이는 것을 고르고 싶건만. 추가주문을 할 때면 점원을 불러 다시 메뉴판을 가져오게 하고, 메뉴를 다 선택할 때까지 점원은 옆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거나 혹은 나중에 다시 오는 번거로움을 반복한다.
지금은 물론 큐알코드로 스캔해서 자주적 주문이 가능한 가게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재래식 메뉴판을 펼쳐보기를 원하는 고객이 많다. 가게에서 메뉴판을 가져가는 리유를 검색해봤더니 메뉴판 제작원가가 비싼데 고객들이 메뉴판에 음식을 쏟거나 가격을 고쳐놓는 등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상에 오른 료리와 메뉴판의 사진을 비교해보고 불만을 토로하는 확률, 메뉴판을 계속 보면 주문을 번복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리유를 알고 보니 기분이 더 나쁘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줄 알았는데 무슨 통털어 민페손님 취급을 하다니.
음식을 맛갈스럽게 사진 찍어서 정성스럽게 제작한 메뉴판을 곁에 그냥 두면 견물생심이라고, 고객들의 구미도 자극하고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하는 로파심도 거둬들여야겠다.
그 어떤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이 고객이다.
소비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인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즐거움과 감동이 동반되여야 한다. 정서적인 가치가 동반될 때 비로소 고객의 만족은 극대화될 것이다. 하물며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든 고객체험을 연구하는 UX심리학이 엄청 인기라고 하는 마당에. 가게에 코 끌려다니기를 원하는 고객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언제 제품에 따라서 입맛을 변화시켰던가?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