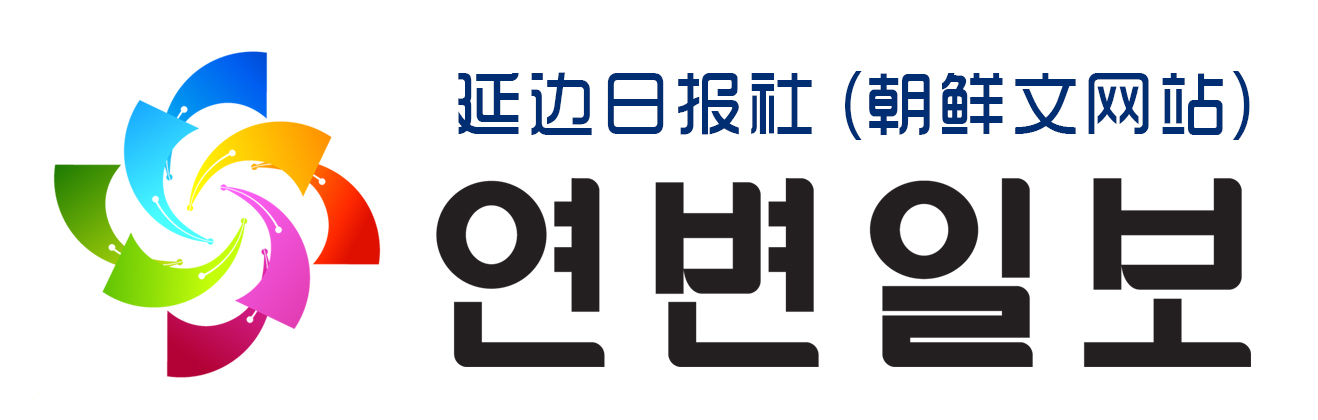구십 로모를 집에 모셔왔다. 집안이 대뜸 화기로 넘쳐났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전에 다른 시가지에 살고 있는 엄마가 근심돼서 하루건너 전화하고 한달에 한두번씩 엄마 보러 다니고 뻐스에 반찬 따위들을 해서 보내던 번거로움을 덜고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위안과 힘이 되였다.
헌데 아직 엄마의 짐도 풀지 않았는데 엄마는 집의 벽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식경이나 바라보더니 마치 신대륙이나 발견한 듯 얘기하신다.
“너네 시계가 참 이상하다. 내 살다살다 이런 시계는 처음 본다. 하나는 구들을 막 청소하며 돌아가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다가 어디서 쏙 나와 돌아가고…”
‘치매가 오셨구나.’
순간 쿵 하고 가슴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의 이런 치매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 안하고 한곳만 뚫어지게 바라보다 하면 꼭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여 나를 섬뜩하게 하군 했다.
한번은 식당 국수를 잡숫고 싶다 해서 사다 드렸는데 잡수라는 국수는 안 잡숫고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였다. “금방 너 어깨 있는 데서 손가락 만한 불색 버러지가 뚝 떨어지더니 저기로 벌레벌레 기여가잖니?”
또 밤중에 일어나서는 매트의 전기스위치를 툭툭 치더니 자는 나를 자꾸 깨우며 여기에 먼지가 가득 있으니 빨리 닦아내라고 하는가 하면 벽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벽이 새서 흠뻑 젖었는데 어찌겠는가고 자꾸 얘기하신다. 또 웃집에서 장식하더니 집에 모래가 가득 깔렸다며 빨리 쓸어내고 닦아내라고 하는가 하면 한밤중인데도 날이 밝았다며 일어나서는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였다.
이외에도 많고 많은 엄마의 이상한 말들과 행동은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런 엄마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아무 방도도 생각나지 않은 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손만 비비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간장만 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용교실의 한 친구가 치매는 초기에 잘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며 자기 엄마의 치매를 모 병 원의 한 의사가 치료해주어 기본상 완쾌되였다면서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였다. 너무 고마웠다.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이튿날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덕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였다. 의사선생이 너무 친절해서일가 엄마의 병 증상을 말하는데 왠지 목이 꺽 메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를 겨우 설복해서 집에 모셔왔는데 우리 집에 오자마자 인차 돌아가시면 난 언제 효도를 해보나? 제발 별다른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는데…
일찍 맏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시동생, 시누이 그리고 우리 자식들까지 십여명도 훨씬 넘는 대가족과 함께 살면서 한 엄마의 모진 시집살이, 우파로 몰려 거의 20년간이나 모진 고생을 하신 아버지와 함께 그 험난한 세월을 꿋꿋이 버티여오신 엄마,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세상 뜨실 때까지 장장 8년 동안이나 대소변을 받아내고 차사고로 식물인이 된 며느리를 6년 동안 돌보며, 또 넉달 된 손자까지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하신 엄마.
“고생고생해도 너 엄마처럼 고생한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니?”
문득 넷째 삼촌의 하신 말씀이 내 어깨너머로 아스라하니 들려오는 것 같다. 엄마의 한생을 생각하니 불쌍하기 그지 없었다. 이미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병원 복도에 나와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흐르게 내버려두자. 남들이 보겠으면 보라지. 이렇게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났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아이처럼 반겨주었다. 왠지 병원에서 눈물이 나더라며 “엄마 죽지 마, 내가 좀 엄마한테 더 효도해보게.” 그랬더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너를 애먹이지 않다가 죽어야겠는데, 뼈를 잘못 쓰는 너를 그만 애먹여야겠는데.”라고 하시는 것이였다. 내가 엄마에게 무용교실에 가려 해도 엄마가 근심돼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아니야, 너 꼭 가야 한다. 그런 운동까지 안하면 넌 더 아프지. 너 없을 때 안 죽는다.” 그러시는 것이였다. 그때 엄마의 정신 든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던지…
엄마의 치매 증상은 의사의 약을 잡숫고 기적적으로 많이 나아졌다. 그런데 치매가 좀 나아지자 또 소변을 못 보신다. 질경이씨(车前子)를 끓여서 대접해도 효과가 없었다. 급한 나머지 밤 열한시가 넘었는데 훨체어에 앉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허나 주사를 맞고 점적 주사를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뇨도에 관도를 꽂고 소변을 받아내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때시걱이면 나는 엄마와 늘 먹는 걸로 입씨름을 하군 했다. 밥 한냥에서 좀 더 담을라 치면 자꾸 덜어내라고 하신다. “더 잡수.”
“못 먹겠다.”
우리는 매일 밥 담는 걸로 실랑이질이다. 생각하다 못해 밥을 눌러 담는 것으로 깜쪽같이 속여 넘겨서 좀 더 잡숫게 했다. 엄마를 잘해드리려고 식사 때마다 얼마나 애썼던가!
손톱을 깎아드리는데 불쑥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네 밥 먹언?”라고 하는가 하면 기척소리에 눈만 떠도 “네 밥 먹언?” 하며 하루에 얼마를 물어 보는지 모른다. 정신줄을 다 놓아버린 지금 자신의 이름마저 거의다 잊어버리고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하면서도 자식들의 ‘밥’사랑만은 여전하신 엄마, 눈만 마주치면 물어보는 이 말에 질리다가도 그 옛날 일곱자식들을 굶겨 죽일가 봐 등골뼈가 휘도록 일한 엄마가 생각나 목이 꺽 메군 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가 보다.
“너네 집으로 오니 제 집에 있을때처럼 편하구나.”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나 옛날 사상이 있는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네 집에 가지 못하고 딸인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이 아닌가고, 배 아프게 낳았으면 다 자식이지 딸네 집에 있는 것이 왜 그리 미안한가?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늘 위안하군 하였다. 엄마를 모시면서 나는 부모에게 돈이나 옷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사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웃으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엄마가 세상 뜬 후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자. 엄마의 손발이 되여 매일 기쁘게 해드리고 잘 보살펴드리자. 치매끼가 있고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엄마이지만 내 옆에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런 작은 효도로 어찌 하늘 같은 엄마의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있으랴! 이러한 생각이 밑거름이 되였기에 엄마를 모시는 동안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자리에 누워 꼼짝 못하는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나의 손이 가야 했는데 허리병이 심하여 일년에도 몇번씩 입원하는 나로 말하면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였다. 하루 세끼 식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프면 밤중에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으며 욕창이 날가 봐 자주 돌아눕히기도 해야 했다. 세수를 안하겠다고, 목욕을 안하겠다고 떼질 쓰는 엄마를 얼리고 닥치고 해서 겨우 시키고 나면 온몸은 늘 땀투성이로 되군 했다. 내 팔목보다 더 약한 엄마 다리를 문질러드릴 때면 늘 가슴이 아파 속으로 눈물을 삼키군 했다. 꼬부라진 몸을 가누며 화장실 출입을 겨우 하는 엄마가 넘어질가 봐 걸음마 타는 아이 돌보듯 늘 따라다니던 그때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엄마에게 효도하던 그때가 힘들었지만 제일 행복했었다. 그때가 많이 그립다.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는 이부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였다. 사망하기 50여일 전이였다. 더럭 겁이 났다. 변기통에 앉히려고 일어서면 이미 말을 못하는 엄마는 내 허리가 근심되여 한사코 손사래 치며 못 오게 하다가도 금방 나를 도와주려고 온 큰언니에게는 시름 놓고 당신을 맡기는 것이였다.
엄마를 모시면서 힘들 때면 왠지 저도 모르게 머리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란중일기》의 저자 리순신 장군, 《란중일기》를 통하여 리순신은 위대한 전략가요 문무가 겸비한 영웅으로서 임진왜란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고 또 나라를 구한 용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란중일기》에서의 리순신의 나라사랑도 크게 감동을 주지만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전란중에서도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늘 눈물을 흘리고 그리며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리순신 장군, 그의 진솔한 일기들을 읽어내려가노라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전쟁중에도 어머님을 곁에 모시고 효를 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리순신의 인물됨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오늘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까지나 본받아야 할 효자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세상 뜨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의 빈자리만 봐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크게 앓아 누웠다. 그런 내가 시름이 안 놓여 언니는 한 열흘 넘게 남아 밥도 해주고 동무도 해주다가 돌아갔다. 나 스스로는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잘한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잘못했던 일들만이 새록새록 떠올라 나를 괴롭히군 한다.
“어버이 살아계실제 섬기기를 다 하여라/ 한번 가신 뒤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 뿐인가 하노라” 어제도 오늘도 내 마음을 울리는 정철의 시구이다.
효사상은 시대와 리념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별반 없다. 효는 또한 한 사람의 사람됨을 재는 척도이기도 한바 이는 인륜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라고도 생각된다.
효도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언제나 효를 말하고 효를 실천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오직 이 길만이 행복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길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