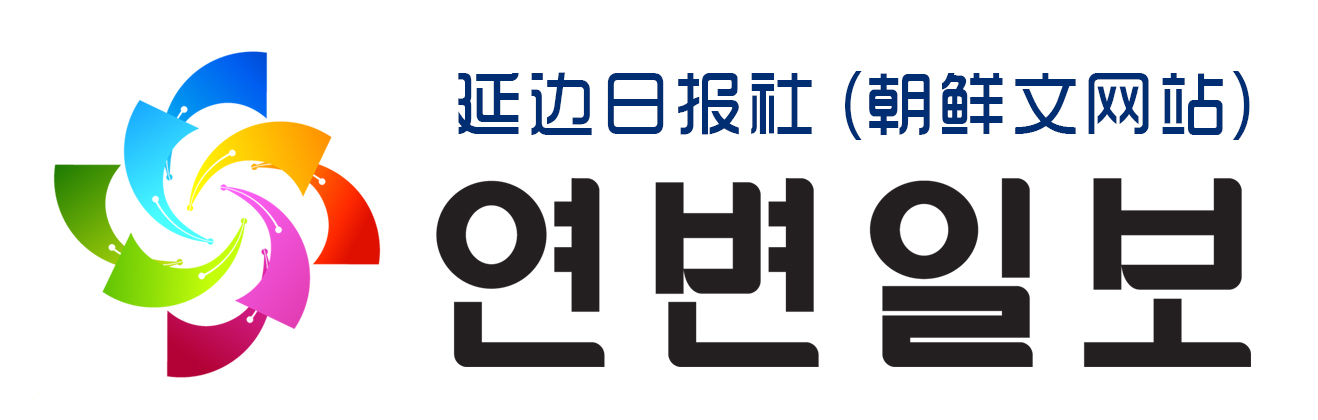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로 알려진 나무늘보들 사이에서 배속에 먹이가 들었는 데도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날씨 탓에 나무늘보의 몸속에서 소화를 돕는 장내의 미생물이 사라져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CBS방송에 따르면 중미 국가 꼬스따리까에서 나무늘보 개체수를 조사해온 과학자 베키 클리프는 어느 순간부터 발견되는 나무늘보 수가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늘보들 사이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질환이 돌고 있다면서 “우리는 덥고 건조한 극단적 건기와 춥고 비가 내리는 길고 극단적인 우기를 겪고 있는데 이건 나무늘보들이 생존하도록 진화된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낸 건 나무늘보의 배속에서 잎사귀를 소화하던 미생물들이 너무 쌀쌀해지면 죽어버린다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겉으로는 멀쩡히 먹이를 먹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기운을 잃고 극도로 허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꼬스따리까는 국토의 절반가량이 원시림으로 덮인 생물 자원의 보고로 평가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어왔다.
년중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수십년 전만 해도 20여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일 이상으로 많아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폭풍과 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빈번해졌다.
꼬스따리까에는 전체 6종의 나무늘보 가운데 두종의 나무늘보가 서식한다.
과학자와 활동가들은 나무늘보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도우려 하지만 숲속에서 나무늘보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나무늘보는 전력 질주 속도가 시속 200메터에 불과할 만큼 느린 대신 위장 실력은 타고났기 때문이다.
베키 클리프는 “이들은 위장술의 대가가 되기 위해 지난 6400만년 동안 진화해왔다.”고 말했다.
인간의 활동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면서 서식지가 위축되는 것도 나무늘보의 생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나무늘보는 일생의 90%를 덩굴이나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지내는데 최근 들어 전기줄을 잘못 붙잡았다가 화상을 입고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신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