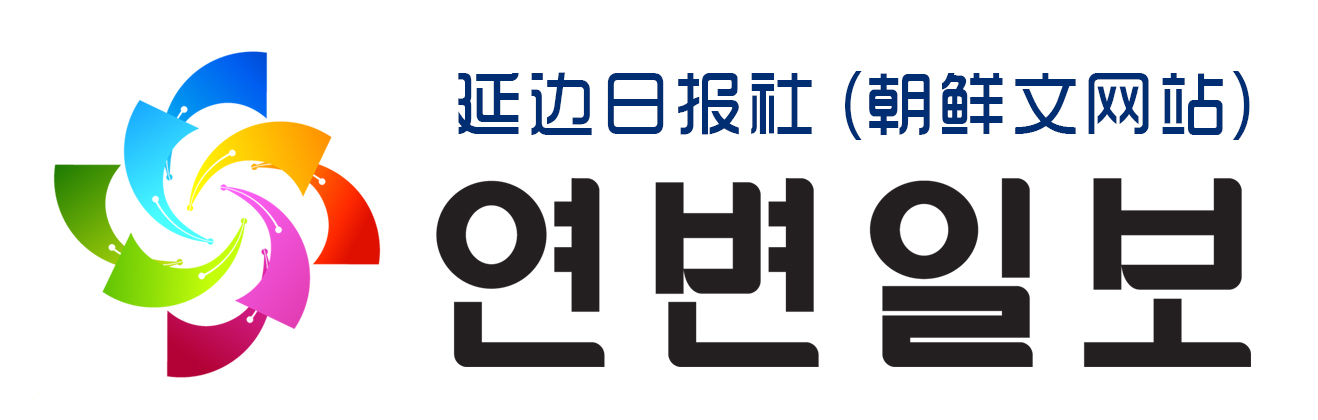아이가 갑자기 학원에 가기 싫다고 나누웠다. 점심을 해먹이고 학원에 바래다줄 예정이였던 나는 음식준비 전투를 갑자기 종말 짓고 멍하니 서있었다.
평소에 아무리 교육 관련 강좌를 들었다 한들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는 늘 해답을 찾기 어렵다. 사람이 천차만별이고 경우가 가지각색이라 제자리를 찾아 앉으려면 갈팡질팡이다.
머리속으로는 학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어떻게든 얼리고 닥쳐서 보내야 했다. 일단 이마부터 짚어보았다. 멀쩡하다. 리유를 물어보니 피곤하다, 힘들다고 한다. 누군들 안 피곤할가, 너의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느라 밖에서 뱅뱅 돌아치는데 너는 고작 학원 하나만 다니는데 뭐가 피곤하냐고 다그쳤다.
딸내미가 왜 학원에 가야 하냐고 반문한다. 옳다구나, 말재주를 살려서 설득시키려고 보니 내세울 만한 리유가 없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리유도, 학원에 낸 학비는 환불받지 못한다는 리유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엄마가 그 부근에서 장을 봐야 한다는 리유도, 딸내미의 드팀없는 눈빛 앞에서 무참하게 색이 바랠 뿐이였다.
“학원에 어떻게든 보내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우선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니 기분이 어떤데?”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딸내미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너무 지친 모습이였다. 사실 공부하라 다그친 적도 크게 없고 주말에 나가 놀거나 휴대폰을 갖고 노는 것도 별로 제한한 적이 없다. 기중시험을 앞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다 그 압력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다. 정신적인 고단함이 엄습한 듯 했다.
돌이켜보니 아이 규률성을 엄격하게 강조한 건 유치원 때부터였다. 그때 같은 반 아이들은 감기나 이러저러한 리유로 결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부모들은 그저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리유만으로 어떤 날에는 공연히 빼먹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집단생활이란 규률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리유 없는 결석은 절대 시키지 않았다. 만약 유치원에 가기 싫을 때마다 “그래, 알았어.” 하며 보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면서 하기 싫은 일은 쉽게 포기하는 성향으로 자라날가 봐 걱정되였던 것이다. 정작 나는 두통이 약간 도져도 결근을 했으면서 아이한테는 왜 그런 자대를 들이댔던가… 아이 내면의 감수를 직시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았던가? 소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또 무엇이던가.
사실 외진 4선도시지만 교육열만은 정말 뜨겁다. 유치원부터 인생계획 설계에 관해 상담받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 더욱 넓은 곳으로, 더욱 선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는 부모가 많다. 그럴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떠밀려서 나는 어쩌면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작정 다그치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공부, 학원, 규률 등 모든 부가적인 요소들을 제쳐놓으니 그제야 아이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문제의 중심인 사람을 들여다보니 제꺽 공감이 되였다. 그래, 힘들면 쉬자. 기말시험이 오라지 않은데 압력이 너무 크지?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동안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로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통은 상대방의 내면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학원에 가야 하는 100가지 리유를 대면서 아이를 계속 내몬다면 근원적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처치가 제대로 안되여 붕대를 적시는 피자국처럼 계속 슴배여나올 것이다.
자기 마음이 누군가의 공감을 얻고 리해를 받을 수 있기를 갈구하는 건 누구나 똑같다. 하지만 “버선목이라 뒤집어보이기 힘든 것”도 사람마음이다. 때문에 저절로 주기적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주변 사람의 리해가 더해진다면 삶에는 큰 동력 부여가 된다. 상대의 두 눈을 마주보며 내면의 상태를 관심하고 리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이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