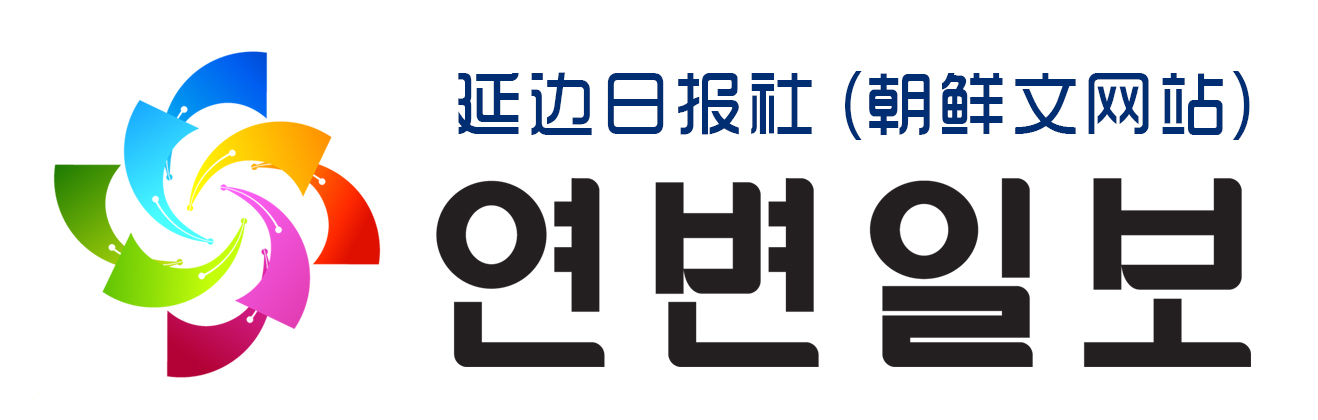어느 책에서 읽기를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번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스치듯이 나누는 인사에는 얼떨결에 “저기(위치)요.”라는 지시대명사를 쓰거나 “일이 좀 있어서…”라며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경우를 어렵잖게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또 마음속에서는 분명 원하지 않지만 입에서는 불현듯 그 반대의 목소리가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다.
나에게도 참 우스웠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사회 초년생이였을 때였다. 어느 기중시험 때였는데 나는 채점을 다그치려고 점심밥도 거른 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시험지 매기기에 한창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부교장이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점심 먹었소?”라고 묻는 것이였다. 너무 갑작스런 부교장의 출현에 나는 벌떡 일어서는 한편 “예에? 예예.” 하고 얼버무려버렸다. 그랬더니 부교장은 배달시킨 도시락이 마침 하나 남아 주려고 했는데 아쉽다면서 자리를 뜨는 것이였다.
“아! 세상에.”
사실 배에서는 언녕부터 꼬르륵꼬르륵 밥 달라는 신호음을 련발했건만 신입으로서 나에게는 뱉은 말을 다시 주어담을 용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채점 내내 머리 속은 후회와 자책과 도시락 생각으로 뒤엉켰던 기억이 난다.
가끔 우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며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특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욱더 린색한 것 같다. 집에 갈 적마다 엄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바쁘다. 그때마다 나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서 툴툴거리기 일쑤지만 사실 진짜 속내는 엄마가 안스러워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아버지는 쓰레기통이 차기 전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으면 자꾸만 밀걸레를 집어들고 여기저기 닦아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했던 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쓰레기가 차지 않았다는 둥 그렇게 걸레질하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둥 하면서 흠을 잡는 것이였다.
또 싫은 부탁을 해오는 친구에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아니요.”를 도로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숨겨가며 감정을 속일 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시험 감독을 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를 주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애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오는가 하면 시험지를 바치고 나서도 “로쓰 짜이짼!” 하고 다정하게 인사한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인사성이 참 밝다. 적어도 선생님을 보면 피하거나 모른 척하던, 내가 학생일 때보다는 훨씬 인사를 잘한다. 하지만 꼭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여야만 인사를 하고 선생님인 걸 알면서도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인사를 하려 하지 않거나 학교 밖에서는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뻐스를 타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발을 딛거나 해도 “미안합니다.”라는 그 흔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어쩌면 고백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닐가?
예로부터 우리는 감정표현을 많이 아꼈던 것 같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서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좋아도 안 좋은 척 싫어도 싫은 척을 쉽게 할 수 없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월에 우린 내 마음속에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해도 좋아해도 쉽게 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아닌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우니까.
풍성한 가을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부보님에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좋아한다고 한번 제대로 된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가?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