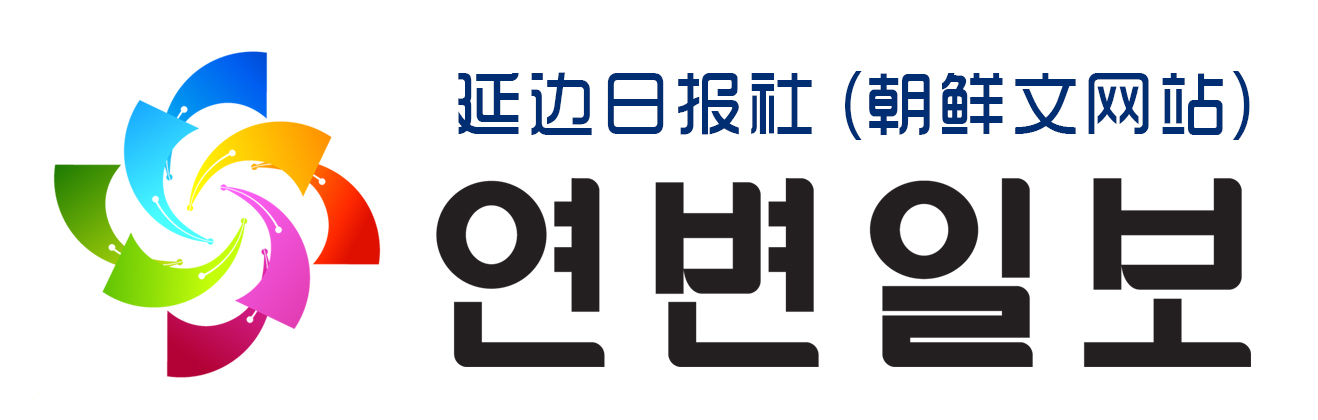삼형제바위.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연길시 소영진 오봉촌. 이곳은 오늘날 항일 력사와 생태 관광이 조화를 이룬 전국문명촌으로 자리매김했지만 1930년대에는 일제의 강압 통치와 항일혁명의 불길이 치렬하게 타오르던 현장이였다.
1930년대초, 일제는 이곳의 풍부한 금자원을 탐내며 마을 북쪽 후산일대에 여러 광구를 개설하고 수많은 로동자를 강제 동원해 금을 수탈했다. 당시 광부들은 가혹한 로동에 시달렸으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오봉촌 광장 봉황 조형물.
1932년, 중공팔도구위는 오봉금광에서 지하 항일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윤병화 부부를 파견해 오봉금광당지부를 설립했다. 부부는 로동자들을 조직해 임금 인상과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끌었다. 또한 화약과 도화선 등 물자를 빼내 연길현항일유격대에 전달하는 등 비밀리에 항일투쟁을 지원했다. 이 화약으로 제작된 ‘연길폭탄’은 팔도구 일본경찰서 습격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십명의 광부들이 자발적으로 항일유격대에 가입했고 오봉금광당지부는 항일유격대와 협력해 팔도구 시가지를 여러차례 습격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활발한 저항을 이어갔다.
항일운동이 확산되자 일본군은 1933년 8월 14일(음력) 대규모 탄압을 시작했고 오봉금광 당조직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항일지사들이 희생되였다.

일제 보루 유적.
일본군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 주요 지점에 보루를 세우고 무장 경비대를 상주시켜 탄압을 가했으며 체포된 항일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한 ‘수감실’까지 운영했다.
8평방메터의 지하물감옥은 모기와 벌레가 창궐하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갇힌 사람들은 박테리아로 가득찬 오물 속에서 상처 염증이 악화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해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모든 과정은 길고 잔인한 인권 유린이였다.
당시 유격대는 수감실에 체포된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고 작전중에 윤철주, 왕영복, 김정완 세명의 지하당원이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적들은 이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지만 어떠한 가치 있는 정보도 얻지 못했다. 세 동지는 결국 살해당했다. 후인들은 세 영렬을 기리기 위해 마을의 ‘자매봉’을 ‘삼형제바위’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오봉금광반일투쟁전시관 내부 모습.
1934년, 배신자로 인해 윤병화의 신분이 로출되자 그는 탈출 기회를 포기하고 동지들에게 탈출하라고 전한 후 체포되였다. 그의 아내 김화자도 함께 붙잡혔다. 두 사람은 적의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조직의 비밀을 루설하지 않았으며 결국 적들은 쓸모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윤병화 부부를 서산구로 끌고 가 총살했다.


수감실 내부 모습.
오봉촌당지부 서기 공유가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오봉촌도 없었을 것”이라며 력사의 무게를 전했다.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오봉촌은 오늘날 ‘일홍 일록 일학’ 관광특색촌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유가는 ‘일홍 일록 일학’의 마을 발전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홍’은 오봉촌의 홍색자원과 력사적 맥락을 깊이 발굴하여 일본군 보루, 금광 유적, 일제병원과 수감실 유적에 설립한 오봉금광반일투쟁전시관, 삼형제암 등 홍색경관으로 엮은 3.8킬로메터 길이의 홍색관광로선을 가리킨다. 공유가는 “유적지에 전문 해설원을 배치해 력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중”이라고 덧붙였다. ‘록’은 오봉촌의 록색 생태 자원을 충분히 발휘해 록수청산을 금산은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수지, 벼관광회랑, 낚시, 전통민박 등 생태관광은 도시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학’은 학습형 마을을 건설하려는 뜻으로 농촌체험을 주제로 하여 촌민들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봉촌은 홍색자원과 생태우세를 활용해 촌 집체경제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고 농민들의 생산, 생활 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였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 ‘력사교육+생태체험’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오봉촌은 홍색 력사가 마을의 뿌리가 되였고 푸른 자연이 미래의 자원이 되였다. 마을 광장에 우뚝 선 붉은 봉황 조형물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오봉촌의 상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 김은주 기자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