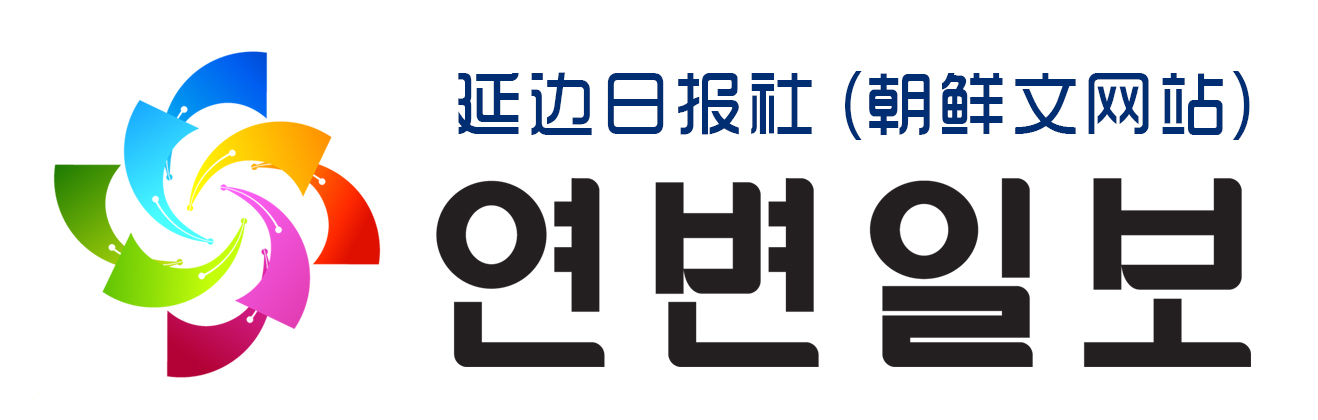국제학술지, 연구결과 공개
우리 나라의 만리장성은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작용에도 손상이 거의 없고 이끼 등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이끼 등을 제거해 초기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만리장성이 20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로 표면을 덮은 이끼와 같은 생물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중국농업대학교 소파 교수가 이끄는 중국과학원 토양, 수자원 보존 및 생태환경 연구중심 연구팀은 만리장성 흙벽의 침식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끼와 같은 생물피복체가 억제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과학 진전》 최근호에 공개했다.
만리장성은 동북쪽의 하북성부터 서남쪽의 감숙성까지 잇는 총길이가 8800여킬로메터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이다. 기원전 200년에서 명조(1368년-1644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거치며 증축되고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광대한 범위와 몇세기에 걸친 오랜 건축기간으로 력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만리장성의 토대는 흙벽이다. 비바람에 의해 지반이 깎이는 침식 작용이나 물이 증발하고 남은 염분이 토양에 집적되는 염류화 현상에 취약하다. 춥고 건조한 지역에 걸쳐있어 저온에 꽁꽁 얼었다가 날이 풀리면 융해되는 과정을 해마다 반복해 겪는다.
연구팀은 만리장성이 이러한 환경 조건에도 원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리유를 성벽의 67.1%를 덮고 있는 생물피복체에서 찾았다. 생물피복체는 람조(蓝藻)박테리아, 이끼, 지의류(地衣) 등 미생물이 단단히 결합돼 토양 립자를 구성한 것이다. 빛을 에너지원으로 리용하며 광합성을 하는 식물, 박테리아 유기체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성벽에 형성됐다.
연구팀은 만리장성 성벽에서 생물로 덮여있는 흙 표본과 맨 흙으로만 이루어진 표면의 표본을 각각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성벽은 이끼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피복체로 덮여있다. 이러한 생물피복체는 흙벽 토양립자 사이의 작은 틈인 공극과 흙 속으로 침투한 물을 보관하는 가느다란 관인 모세관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흙벽에 침투되는 수분을 평균 5.2% 줄였다. 성벽에 붙은 이끼류는 수분 침투력을 약 5.5%에서 22.6%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흙벽에 가해지는 외부압력에 대항하는 효과도 있었다. 생물피복체로 뒤덮인 흙벽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는 강도가 맨 흙벽 상태일 때보다 약 124% 높았다. 염류가 흙 속에 모이고 쌓아지면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토양 염류화 정도는 40%가량 줄었다. 토양 염류화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연구팀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생물피복체가 춥고 건조한 지역에 자리잡은 만리장성 성벽을 염류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만리장성 흙벽의 바이오크러스트가 비바람에 의한 침식 위험을 줄이고 흙벽 자체의 기계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인정했다. 또 생물피복체가 문화유산의 ‘파괴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도 인정했다.
이번 연구는 자연이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학기술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