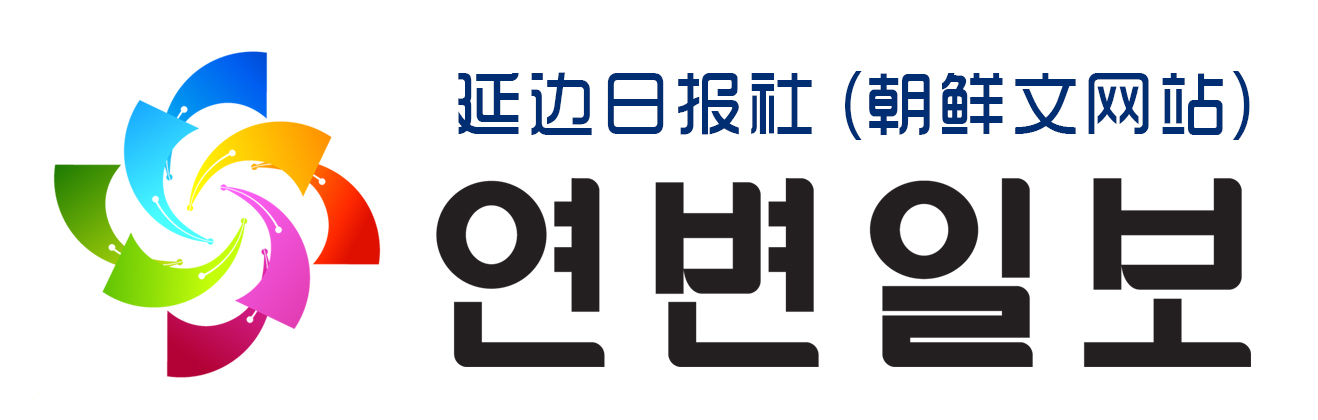참대숲이 우거진 외로운 호수가에서 백로 한마리가 한창 물속에 주둥이를 넣고 물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웬 까마귀 한마리 날아내리는 것이 푸른 호수물에 비꼈어요.
“까욱- 까욱-”
백로는 가뜩이나 호수에 먹이가 날따라 줄어드는 판에 까마귀까지 끼여들자 쫓아버리려고 작심했어요. 백로는 하얗고 긴 목을 빼들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에이, 까마귀 울면 재수 없다더니. 아침부터 참 재수 없어.”
까마귀는 까만 털을 부시시 털더니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헤맸어요.
백로는 하얀 가슴을 쑥 내밀고 목을 빼들고 잘난 척하면서 지껄이였어요.
“종달새처럼 목소리나 고우면 몰라도, 흥, 너네 까마귀들은 왜 ‘종달새 지종 하늘에 날고’ 이런 노랜 모르냐. 하다 못해 알락까치처럼 ‘까까까’ 할 줄도 몰라? 흥! 맨날 듣기 싫게 ‘까욱, 까욱’이냐? 너네 목소리 어지간히 듣기 싫었으면 사람들이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 너넬 욕했겠어. ‘까마귀 하루에 열두마디를 울어도 송장 먹는 소리’, ‘까마귀 열두가지 소리 하나도 고운 것이 없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욱 소리 뿐’. 너네 까마귀한테 딱 맞고 딱 떨어지는 속담이야, 히히히.”
까마귀는 듣다 못해 한마디 대꾸했어요.
“남이야 ‘까욱’ 하든지 말든지 웬 랭수에 이빨 부서질 소리냐?”
“허허, 검정돼지 같은 놈, 언감생심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얀 선녀께 대들어?”
백로는 긴 목을 빼들고 껑충한 다리로 까마귀한테 다가가더니 깃털을 물어당겼어요.
“아갸갸, 왜 이래?”
“이놈 까마귀야, 넌 까마귀 고기를 먹어 까맣게 잊었어? 넌 온몸이 새까매. 어째 재물 배때기에 빠졌다가 나와 이래? 온몸이 검정돼지 같구나. 깔깔깔, 이름도 까마귀라고 지은 걸 보면 너네 귀는 까만 귀냐? 어디 보자. 까만 귀야. 흐흐흐.”
까마귀는 시끄러워 푸드득 날아 저 쪽으로 가 먹이를 계속 찾았어요.
백로는 따라가면서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봐라. 세상엔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색갈이 알락달락 얼마나 곱니? 고운 색이 많고도 많은데. 어쩜 너네 엄마는 널 이렇게 못나게도 새까맣게 낳았느냐?. 날 봐라. 백설처럼 하얀 몸매에 머리엔 빨간 리봉을 맸지, 얼마나 예쁘냐? 체격은 또 얼마나 백설공주처럼 쭉 빠졌느냐?”
“얘, 너하고 말싸움 할 새 없어.”
까마귀는 저쪽으로 또 날아가 먹이를 찾았어요.
백로는 아무리 놀려줘도 까마귀가 달아나지 않자 까마귀 곁에 슬금슬금 다가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야, 까만 귀(까마귀)야, 남의 말이 들리지 않니? 이 호수가에 날따라 먹이가 줄어드는 판에 너까지 끼여들어? 이젠 우리 백로들이 뭘 먹고 살겠느냐? 넌 겉만 까만가 했더니 속까지 새까맣구나.”
참고 참던 까마귀도 한마디 반격했어요.
“백로야, 오늘 보니 넌 겉은 백설 같지만 속은 꺼멓기로 말 못할 애구나. 야비하게 남을 헐뜯긴.”
“뭐, 뭐?”
백로는 더는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주둥이를 물에 걷어넣고 물고기를 잡는 척 하면서 어떻게 또 진공할가고 궁리를 굴렸어요.
한참 후에야 백로는 또 한마디 했어요.
“만물의 령장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겉에 속이 절반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난 겉이자 속이야. 마음도 새하얗고 깨끗하지. 흐흐흐.”
까마귀는 더 말대꾸를 하지도 않고 죽은 수달 고기를 물고 하늘로 날아올라갔어요.
“야, 너넨 전문 죽은 고기를 잘 먹어 그런가 보다. 못나고 못나게 새까맣게 번졌지. 너넨 아마 까만 마귀라고 까마귀라고 이름을 달았는지도 몰라. 얘, 까만 마귀야, 우릴 봐라. 생선을 먹어서 얼마나 호수가 백조처럼 흰가? 호호호.”
백로는 호수가에서 코노래까지 흥얼흥얼 부르며 까마귀를 흉내 내여 날개를 퍼덕이며 외발뜀을 뛰면서 춤까지 춰댔어요. 그러나 하늘 높이 날아올라가 점점 흑점으로 변해가는 까마귀를 보고 멋적어졌어요. 구경군이 없는 독무를 추긴 너무나도 싱거웠어요.
“아니야, 저놈을 쫓아가 계속 놀려줘야지.”
백로는 푸드득 하늘에 날아올라 까마귀를 뒤쫓아 날아갔어요.
그는 솜뭉치 같은 구름을 헤가르고 날아나와 아래를 살폈어요. 오리무리 속의 거위처럼 저 먼발치 참대숲 속에 우뚝 솟은 백양나무가지에 커다란 까마귀 둥지가 보였어요.
백로는 까마귀 둥지를 향해 직하강하면서 살폈어요.
“아차, 저게 뭐야? 까마귀 둥지에 웬 털도 없는 벌거숭이 새가 있어? 새끼를 낳았어?”
백로가 백양나무가지에 날아내려 까마귀 둥지를 찬찬히 살폈어요. 까마귀가 한창 부리로 수달 고기를 찢어 벌거숭이 새한테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죽 밖에 남지 않은 벌거숭이 새는 새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컸어요.
까마귀는 둥지 우 상공을 배회하는 백로를 본 척 만 척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앙상하게 말라버린 벌거숭이 새한테 계속 고기를 찢어 한점 한점 먹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 누구냐?”
까마귀는 까만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멘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야.”
“응? 앓느냐?”
까마귀는 머리를 끄덕이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늙으신 어머니께선 이젠 털이 다 빠져 날지 못해. 아무 것도 잡아 잡숫지 못해. 으흐흑, 까욱, 까욱.”
그제야 백로는 횡설수설한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는 까마귀를 보기 너무 창피해 푸드득 백양나무가지에서 날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백로는 며칠이고 까마귀 둥지 상공을 빙빙 날아돌면서 살폈어요.
을씨년스러운 가을하늘에서 비가 구질구질 지꿎게 내렸어요. 그러자 까마귀는 자기 날개를 펼쳐 벌거숭이 어머니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까마귀는 또 날마다 사처로 날아다니면서 물과 고기를 물어다가 어머니께 대접하면서 지극한 효성을 다했어요.
까마귀는 늙어서 털 한대도 없이 다 빠진 로모까마귀가 앓다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미까마귀가 사망하자 까마귀는 “까욱, 까욱” 하고 애처롭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그렇게도 처량하게 하늘 높이 메아리쳤어요.
그때부터 백로는 다신 까마귀를 욕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찬탄을 금치 못했어요.
“까마귀야, 미안해. 오해했구나. 넌 겉은 새까매도 속은 비길 데 없이 효성이 지극한 효자새구나.”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