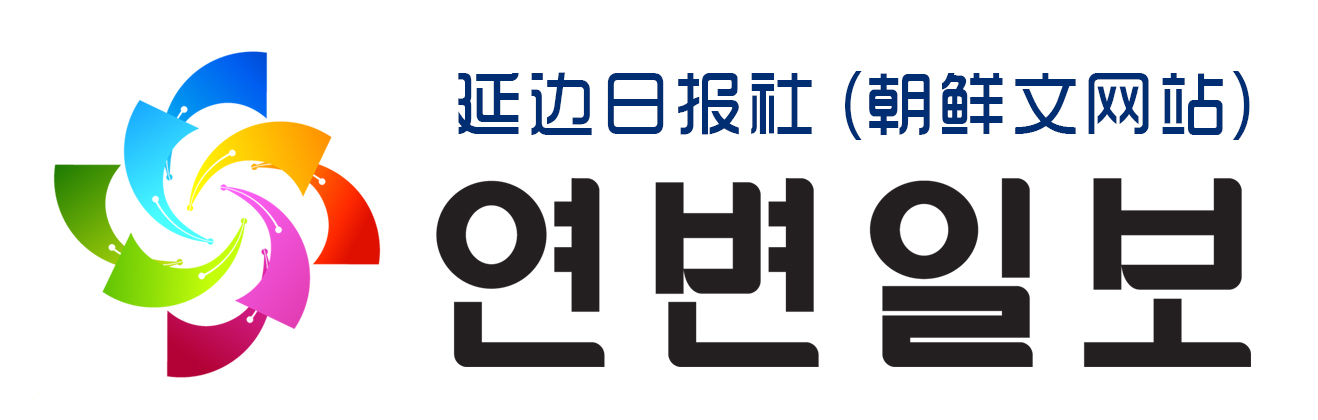요즘 신과 양말, 바지 수선 문제로 식구들의 핀잔을 많이 듣는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는 180원 정도를 주고 두달 전에 산 것인데 겨우 두달을 신고 앞꿈치에 큰 구멍이 생겼다. 회사에서 원재료공급을 맡아 하다 보니 날마다 함지박에 새 원료와 분쇄품을 한데 섞어 삽으로 버무리는데 매번 100킬로그람을 번지기에 너무나 힘에 부쳐 발 앞꿈치로 함지박을 밀어붙이면서 버무리다 보니 신마다 앞꿈치가 닳아 성한 게 없다. 다른 데는 거의 새것 대로인데 앞꿈치만 닳아서 판난 신을 버리기가 아까워 번마다 신수리방에 맡겨 기워 신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색의 테프를 구해서 붙이고 며칠 신었다가 오늘 같은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아들에게 들켜 핀잔을 들었다.
“아버지, 까짓 신 한컬레 얼마 한다고 남 보기 구차하게 그렇게 신어요? 오늘 퇴근길로 상점에 들려 새것으로 사서 갈아 신고 그 신은 버려요. 네! 꼭!”
“그래 알았다.”
이럴 때는 도리를 따지기보다 그대로 들어준다. 40대 아들의 체면도 봐줘야 하니깐.
며칠 전에는 원료를 공급하느라 기계 사이로 드나들다 삐죽 튀여나온 철판에 작업용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다. 그래서 그걸 안해더러 수선점에 가 기워 오라고 부탁했다가 꾸중을 들었다.
“그걸 기워서 남 보기 창피하게 어찌 입고 다녀? 그리고 수선비도 몇십원은 나오겠는데 그냥 버려야지. 시장에 가 새것을 한벌 사 입는 게 낫겠는데?”
내가 보기엔 그 바지를 기워서 입어도 얼마든지 되겠지만 안해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수긍하고 말았다.
나는 보통 한달에 양말 두세컬레는 버려야 한다. 분쇄를 하고 원료를 버무리다 보면 신 안에 원료가 수시로 튕겨 들어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털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털어버리지 못해 앙말 앞꿈치나 뒤꿈치 또는 바닥이 판나는데 그것을 기워 신을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한다. 나절로는 깁지 못하고 안해는 그걸 기워 신으면 그렇지 않아도 아픈 발이 더 불편해서 안된다면서 아예 기워줄 생각이 없다. 하긴 몇해 전에 발 수술을 한 후부터 집에서는 여직 발 보습패드를 신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기에 항상 아깝고 섭섭하다.
지난 세월 과연 얼마나 오래동안 기운 옷을 입고 기운 양말과 신을 신고 살아왔던가? 옷과 바지 뿐만이 아니라 장갑, 모자, 머리수건, 신발과 양말 어느 하나 기워 입고 기워 쓰고 기워 신지 않았던가? 표증시대(票证时代)를 살아온 우리는 ‘신3년, 구3년, 깁고 기워 또 3년’이란 말을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다. 물자가 결핍하던 그 시절에 바느질은 녀인들의 고유한 일상, 필수 기능으로 되여있었다. 그때 나의 어머니는 늘 밤늦도록 희뿌연 전등불을 빌어 식구들의 찢어진 옷이나 양말을 기웠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동무하듯 등불 밑에서 식구들의 해진 신발을 깁지 않으면 이런저런 고장난 가장기물을 수리하군 했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14세 때부터 나의 신발을 혼자서 기워 신었다. 여름철엔 장화도 홀로 고무풀로 때 신었고 샌들 끈이 끊어지면 부엌 앞에 쪼크리고 앉아 불에 달군 못으로 때 붙여서 신고 다녔다.
요즘 시대에는 옷을 사면 수선하면서까지 입는 경우는 드물다. 1970년─1980년대 집집마다 있던 재봉틀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수선의 령역에서 벗어나 나만의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 옷을 찢어 입거나 덧대거나 누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리폼’하는 흐름 또한 이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청바지에 원단을 덧대는 것은 청바지가 찢어져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며 다른 효과를 주기 위함이다. 다시말해 오늘날 일부 수선의 핵심은 예전 상태로의 ‘복원’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띄게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모든 것을 수선해서 계속 사용했다. 항아리, 양동이, 남비, 쇠솥, 우산, 의자, 화로, 키, 가구 등 어느 하나 수선해서 쓰지 않았던가? 집에서 수선할 수 없는 것은 장인들을 찾아가 수선했는데 당시에는 이처럼 각종 물건을 수선하는 장인이 무척 많았다.
천이 찢어지고 살대가 부러지고 손잡이가 끈적거려 사용하지 못하는 우산도 솜씨 좋은 우산 장인은 손때 묻은 도구들을 바꿔가며 부러진 살, 휘어진 대, 찢어진 천을 잇고 펴고 기워서 고친 티가 별로 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수선해주는데 손잡이가 끈적임 없이 매끈하고 우산 살대도 마무리가 튼튼하게 된다. 그것을 다시 펼쳐 사용하면 비바람을 막아주기에 너무나 훌륭하다.
그릇을 고치는 장인은 부서져 가루가 된 것만 아니라면 뛰여난 재주로 그 모양을 잘 맞춰놓고 그 우에 못을 박아 조금도 물이 새지 않는 새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인상이 가장 깊게 남는 것은 “솥을 땜해요, 독(항아리)을 땜해요.(锔锅锔缸)” 하고 큰소리로 웨치며 골목골목을 누비던 솥 땜쟁이들이다. 그들이 멜대로 메고 다니는 나무궤나 밀고 다니는 밀차에는 수선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설비들이 잔뜩 담기거나 실려있는데 거기에는 풀무와 도가니로 만든 작은 난로는 물론 석탄(골탄), 솔가치 및 기타 연료가 있는가 하면 줄, 드릴, 접착제, 뻰찌, 망치, 리벳, 구리선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자른 철판과 알류미늄시트와 같은 많은 도구도 있다. 그들이 골목에 나타나면 주민들은 너나없이 반겨 맞아준다. 조선족들의 부뚜막에는 일반적으로 쇠뚜껑이 딸린 크기가 각기 다른 쇠솥이 세개 걸려있는데 밥솥, 국솥 등 저마다 용도가 다르다. 물자가 극히 결핍한 시대 쇠솥은 한가정에 놓고 말하면 아주 진귀한 재산이 아닐 수 없다. 솥이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자주 솥 밑에 묻은 그을음을 긁어내는 데다 량식이 더없이 귀한 시절이라 어머니는 밥을 하고 밑바닥에 생긴 누룽지는 한톨까지 숟갈로 박박 긁어 숭늉을 끓이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무쇠솥도 세월이 지나면 가운데 구멍이 뚫리기 일쑤였다. 지금처럼 훌떡 내다 버리고 새로 살 형편이 어렵던 시절이라 기다리던 솥 땜쟁이 장인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새 솥 하나를 사는 데 몇원씩 ‘큰 돈’을 들여야 하는데 반해 땜질을 하는 수선비는 고작 몇십전밖에 하지 않기에 하나의 솥은 몇번의 땜질을 거친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땐 새 솥을 샀다. 하기에 오랜 세월 쇠솥 땜쟁이들은 없어서는 안될 재간둥이들로 떠받들려왔었다. 하지만 이토록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했던 가마솥이 서서히 아련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도시건 농촌이건 나무를 때서 밥을 짓던 부엌은 전기밥솥이 대신하고 전기밥솥이 나오면서 가마솥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지금의 아이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해졌다. 아마 지금의 40대 이하 사람들에겐 쇠솥 땜쟁이란 직업마저 생소할지 모른다.
아, 그때는 솜씨 좋은 장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전부 사라지고 없다. 그 결과 페품만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인생은 수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수선은 사람과 물건의 생 어느 시점에서 늘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선은 무언가를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떤 이에게 수선은 결코 새것을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약이 생활방식이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고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새로 산다고 한들 오래된 물건에 깃든 소중한 추억을 대체할 수 있을가?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에 잇고 꿰매고 붙이면서 물건을 고쳐 쓰는 이들이 많다. 새로 사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물건을 고쳐 쓰다 보면 지금 가진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을.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 일상 전반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든다. 오래된 물건을 보며 그에 얽힌 소중한 추억과 인연이 떠오를 때 느끼는 행복은 또 어떻던가? 수선은 단순한 물건의 복원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시간, 경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다.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수선의 세월은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있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