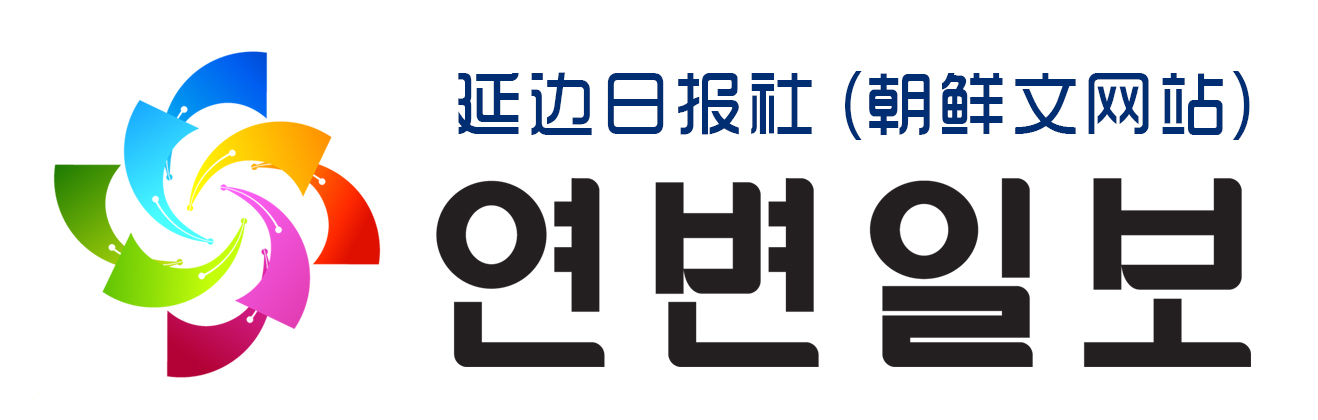고대 애급 유적에서 발견된 뼈의 유전자 검사로 고대 애급 력사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리버풀존무어스대학 연구팀이 4500년 전 나일 계곡에 살았던 한 남성의 뼈 DNA 검사를 통해 고대 애급 문명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
중요한 점은 그의 DNA중 5분의 1이 1500킬로메터가량 떨어진 다른 고대 문명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혹은 현재 이라크에서 살았던 조상에게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두 문명 사이의 련관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생물학적 증거로 애급이 어떻게 분산된 농업 공동체에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중 하나로 변모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문자’와 ‘농업’이 두 고대 세계 사이의 사람과 사상의 교류를 통해 생겨났다는 견해에 새로운 무게를 더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런던 프랜시스크릭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폰투스 스코글룬드 교수는 BBC 뉴스에 고대 뼈에서 DNA를 추출하고 읽을 수 있게 되면 과거의 사건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더 많은 DNA 정보를 얻고 그것을 당시의 고고학적, 문화적, 기록 정보와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력사적 사실은 대부분 서면 기록에 의한 것인데 종종 부자와 권력자들이 쓴 이야기들이다. 생물학적 조사는 력사가와 과학자에게 일반인의 눈으로 력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지역의 교류가 가지는 의미
DNA는 까히라에서 남쪽으로 265킬로메터 떨어진 마을인 누와이라트에 묻힌 한 남자의 유해의 귀에 있는 뼈에서 채취되였다. 그는 기원전 4500년에서 4800년 전 사이에 사망했는데 이는 애급과 메소포타미아의 출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인 시기였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두 지역은 최소 1만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농업 사회가 출현했을 때부터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혁명이 고대 애급에서도 비슷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믿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인 접촉의 증거는 없었다.
리버풀존무어스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유해를 분석한 아델린 모레즈 제이콥스는 이것이 당시 두 문명의 중심지 사이에서 사람과 정보가 이동했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의 문자 체계를 발달시킨 두 지역이 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두 지역이 서로 접촉하며 생각을 교환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대 애급의 DNA 샘플을 통해 서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이동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였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자기 항아리 속 유골 보존 상태 좋아
이 남성은 산비탈을 파서 만든 무덤 안의 도자기 항아리에 묻혔다. 그의 매장은 인공 미라화가 일반적인 관행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의 DNA 보존에 도움이 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그의 치아에 있는 화학 물질을 조사해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고 그로부터 그가 아마도 애급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BC는 과학 탐정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누와이라트 근처 아멘넴하트 무덤의 상형문자는 도예가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여준다.
리버풀존무어스대학의 조엘 아이리시 교수는 이 남성의 개인에 대한 형상을 복원하기 위해 골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했다. 아이리시 교수는 뼈 구조로 보아 이 남성의 나이는 45세에서 65세 사이로 추정됐는데 나이 상한은 그가 관절염 증세가 있기 때문이였다. 그의 키는 163센치메터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 기준으로도 작은편이였다.
아이리시 교수는 그가 아마도 도예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개골 뒤쪽의 갈고리 모양의 뼈가 커져있었는데 이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많이 내려다보았음을 보여준다. 좌골의 크기가 커져 있어 딱딱한 표면에 장시간 앉아있었음을 나타냈다. 팔은 앞뒤로 많이 움직인 흔적이 있었고 팔에는 근육이 발달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익숙했음을 보여준다.
아이리시 교수는 “이런 특징들은 그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평생 일해온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폭격에도 살아남아 연구 가능했던 ‘행운’
리누스 거들랜드 플링크 박사는 이 해골을 연구하고 력사적 비밀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플링크 박사는 “이 유골은 1902년 발굴되여 리버풀 세계 박물관에 기증되였는데 이후 독일 나치 대공습 당시 폭격으로 박물관 소장품의 유해 대부분이 소실되였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 일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되였고 그의 조상중 일부가 비옥한 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으며 당시 여러 집단이 섞여 살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홈페지에 2일 게재되였다.
외신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